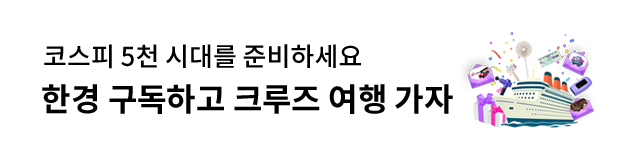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등 13개국으로 구성된 ‘채권시장포럼(ABMF)’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증권사들이 ABMF 참여에 소극적이라며 한 얘기다.
ABMF는 아시아 채권시장 통합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구다. 나라별로 다른 채권거래 제도와 규제 등을 표준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 통합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건 1997년부터다.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 통화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위해 발족한 기구가 ABMF다.
채권시장 통합은 말만큼 쉽지 않다. 나라마다 다른 규제와 시장 관행을 갖고 있어서다. 이를 극복하려면 제도를 표준화해야 한다. 여기서 나라마다 이해가 엇갈린다. 가능한 한 자기 나라의 관행을 표준화해야 제도 변경에 따른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기 위해 증권 유관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노무라와 다이와증권 등 일본 투자은행(IB)들도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ABMF 관계자들은 “채권시장 통합 필요성을 먼저 제기한 건 한국이지만, 주도권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말한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글로벌 IB도 ABMF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민다.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아시아 채권시장 통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이유이지만, 일찌감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국내 증권사들은 조용하다.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든 일에 인력과 자금을 투자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탓이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증권사의 일일 뿐 우리와는 관련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이 통합되면 기업들은 이 시장으로 몰릴 게 뻔하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도 국내 증권업계는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다. ‘증권업계는 천수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김은정 증권부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