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사회양극화 '진범'은 따로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양극화 심화 원인은 일자리 감소
관광 등 고용효과 큰 산업 키워야
효율적인 산업구조 개편도 필요"
김근수 < 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
관광 등 고용효과 큰 산업 키워야
효율적인 산업구조 개편도 필요"
김근수 < 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나 그 혜택이 서민과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듯하다. 이 현상은 MB정부 들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MB정부는 기업이 잘돼야 서민들도 잘살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 등 친시장정책을 폈다. 그러나 내수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고용없는 성장만 계속되는 양상이다. 반면 일부 대기업들은 유례없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일부 정치권에선 재벌 개혁만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돌팔매질이 잦아진 것도 그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벌 기업들은 더욱 더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대기업의 탓일까. 먼저 소득의 불균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살펴보자.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균등이 심해지는 것을 뜻한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1990년 0.256로 1997년 0.257와 비슷하다. 물론 외환위기 때인 1998년 0.285로 급증했고 2011년 현재 0.289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어떨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GDP 대비 매출액 혹은 자산으로 평가했을 때, 이 수치는 1990년부터 1998년 외환위기까지 줄곧 심화됐다.
일부의 주장처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양극화의 원인이라면 왜 1990년에서 1997년까지 지니계수는 악화되지 않았을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긴 했으나 현재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정도는 외환위기 때처럼 높지 않다.
그런데 왜 지금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는가.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 감소에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고용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를 살펴봐야 한다. 고용유발계수란 매출 10억원이 몇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2005년의 10억원을 기준으로 1980년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65명이다. 즉, 10억원을 수출하면 65명의 고용효과를 얻었다. 전체 산업평균치인 60보다 높았다. 그러나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 2010년 6.7명에 불과하다. 전 산업 평균인 10.4명보다도 훨씬 적다.
이처럼 수출의 고용효과가 급락한 이유는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과 자동화설비 등이 노동력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치열한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생산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감소는 필연적이다. 제레미 리프킨이 제시한 ‘노동의 종말’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70년대 노동집약적 제품과 달리 요즘 반도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 모두 고용유발계수가 매우 낮다.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 비교우위를 갖게 된 우리나라 경제에서 고용감소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띨 것이다.
국내 5대 그룹의 자산과 매출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자 수는 1991~1995년 평균 48만명에서 2006~2010년 46만명으로 되레 줄었다. 젊은이에게 괜찮은 직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회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유발계수가 큰 산업 중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건강진단 서비스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국내 관광사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어 고용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특히 의료·관광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전체 산업평균보다 훨씬 높다.
만약 효율성을 무시하고 고용을 무조건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성장동력마저 잃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지니계수의 급증이 시사하듯이 경기침체의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층이다. 사회양극화 문제는 경제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치권도 섣부른 경제민주화로 재벌 때리기에 나설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효율적 재편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구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김근수 < 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
이처럼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일부 정치권에선 재벌 개혁만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돌팔매질이 잦아진 것도 그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벌 기업들은 더욱 더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대기업의 탓일까. 먼저 소득의 불균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살펴보자.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균등이 심해지는 것을 뜻한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1990년 0.256로 1997년 0.257와 비슷하다. 물론 외환위기 때인 1998년 0.285로 급증했고 2011년 현재 0.289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어떨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GDP 대비 매출액 혹은 자산으로 평가했을 때, 이 수치는 1990년부터 1998년 외환위기까지 줄곧 심화됐다.
일부의 주장처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양극화의 원인이라면 왜 1990년에서 1997년까지 지니계수는 악화되지 않았을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긴 했으나 현재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정도는 외환위기 때처럼 높지 않다.
그런데 왜 지금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는가.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 감소에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고용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를 살펴봐야 한다. 고용유발계수란 매출 10억원이 몇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2005년의 10억원을 기준으로 1980년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65명이다. 즉, 10억원을 수출하면 65명의 고용효과를 얻었다. 전체 산업평균치인 60보다 높았다. 그러나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 2010년 6.7명에 불과하다. 전 산업 평균인 10.4명보다도 훨씬 적다.
이처럼 수출의 고용효과가 급락한 이유는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과 자동화설비 등이 노동력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치열한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생산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감소는 필연적이다. 제레미 리프킨이 제시한 ‘노동의 종말’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70년대 노동집약적 제품과 달리 요즘 반도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 모두 고용유발계수가 매우 낮다.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 비교우위를 갖게 된 우리나라 경제에서 고용감소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띨 것이다.
국내 5대 그룹의 자산과 매출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자 수는 1991~1995년 평균 48만명에서 2006~2010년 46만명으로 되레 줄었다. 젊은이에게 괜찮은 직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회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유발계수가 큰 산업 중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건강진단 서비스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국내 관광사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어 고용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특히 의료·관광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전체 산업평균보다 훨씬 높다.
만약 효율성을 무시하고 고용을 무조건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성장동력마저 잃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지니계수의 급증이 시사하듯이 경기침체의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층이다. 사회양극화 문제는 경제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치권도 섣부른 경제민주화로 재벌 때리기에 나설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효율적 재편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구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김근수 < 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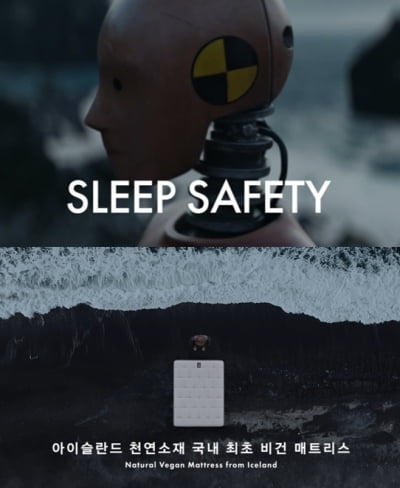

![日메이저 보험사도 한국 제품 쓴다…글로벌 업체 제치고 '잭팟' [이미경의 옹기중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4553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