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한 '업무상 배임' 판결…죄형법정주의 위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 계기로 본 형법의 균형] "경영판단 처벌기준 형법에 명문화해야"
외국선 대부분이 민사 책임
형법 적용 독일은 법률 개정
합리적 판단엔 책임 안물어
학계 "입법의 균형 맞춰야"
외국선 대부분이 민사 책임
형법 적용 독일은 법률 개정
합리적 판단엔 책임 안물어
학계 "입법의 균형 맞춰야"
기업 임원들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처벌 기준을 형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여기에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할 경우 기업가정신이 크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상 배임 인정 여부가 재판부나 시류에 따라 들쭉날쭉해서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기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경영 판단 놓고 엇갈리는 판례
지난 16일 1심 선고가 난 한화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그룹 총수로서 김승연 회장의 역할을 인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3000억원의 빚을 안고 있던 계열사 한유통과 웰롭을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살렸기 때문에 그룹 전체가 부실화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고 변론했다. 이 과정에서 유휴 부동산의 저가 매각 등 일부 편법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룹 오너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 아래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해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배척했다. 이런 판단은 그동안 쌓인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판례도 있다. 1996년 11월 정태수 한보철강 회장의 회사채 399억원에 지급 보증을 선 대한보증보험 심모 대표이사 관련 판결이 대표적이다. 심 대표는 국가 기간산업인 한보철강을 국가가 부도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여러 정황을 고려해 지급 보증을 섰지만 이듬해 1월 한보철강이 부도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해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까지 (배임의) 고의에 관한 해석 기준을 완화해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경영 판단·법적 판단 구조적으로 달라
배임 행위를 형벌로 다루는 나라는 드물다. 대부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우리 상법에도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다. 배임죄를 형법전에 규정한 것은 1851년 프로이센 형법이 효시다. 이 규정이 독일과 일본을 거쳐 같은 대륙법 체계인 한국 형법에까지 들어왔다.
그러나 독일에는 또 다른 규정이 있다. 바로 ‘경영 판단의 원칙’이다. 2005년 주식법을 개정하면서 제93조 주의 의무 조문 뒤에 이 원칙을 신설했다.
회사 업무에 관한 이사의 결정이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임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때는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불문법 국가인 미국에서도 경영 판단의 원칙은 1829년 루이지애나 대법원 판결 이후 판례를 통해 확립됐다. 즉 △경영상 판단으로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이며 △상당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선의로 △재량의 남용 없이 판단하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법조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목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위험 감수를 원칙으로 하는 경영 판단과 가치 합리성, 위험 회피를 특성으로 하는 법적인 판단은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법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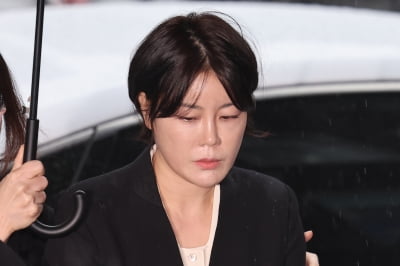
![특허법인 설립한 지평... 세종은 공공조달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4674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