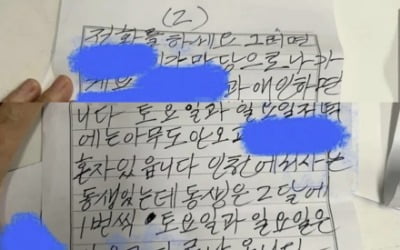"200만원이면 도청·몰카에 위치추적까지 24시간 감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팀 리포트 / 사생활 엿보기의 진화…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현금 보여줘야 제품 보여준다"
시내 한 복판서 버젓이 영업…제품 진열해놔도 단속 못해
선거 앞두고 찾는 사람 늘어 도청·몰카 탐지업체도 호황
"현금 보여줘야 제품 보여준다"
시내 한 복판서 버젓이 영업…제품 진열해놔도 단속 못해
선거 앞두고 찾는 사람 늘어 도청·몰카 탐지업체도 호황
#목포시는 지난 3월 시청 본관 2층 시장실에 1800만원을 들여 ‘도청방지 및 탐지장비’를 설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전남도 내 기초단체장 집무실에 도청방지 시설이 설치된 건 처음이다. 목포시는 불법적인 도청과 감청에 대비하고 개발계획 등 목포시 중요 정보의 사전 유출 방지를 위해 설치가 필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에서도 기관장 사무실 등에는 도청방지 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첩보영화에서나 등장하는 도청장치나 GPS, 첨단 몰래카메라(스파이캠) 등 끊임없이 타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최첨단 장비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도청장치는 국내에서 사고 파는 게 불법이다. 하지만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세운상가 등 시내 중심가에서 버젓이 팔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속은 엄두도 못낸다. 워낙 은밀하게 거래되고 단속반이 손님으로 가장해 적발하더라도 ‘함정수사’라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서다. 게다가 이베이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청기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청장치뿐만 아니다. 안경, 라이터, 시계, 넥타이 등 다양한 모양의 몰래카메라인 ‘스파이캠’, 자동차 등을 24시간 추적할 수 있는 GPS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세운상가 용산상가 등은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몰카 영상·사진 촬영의 진원지”라며 “스파이캠이나 GPS 판매는 원칙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터 절반크기 도청기 300m 거리서도 들려
지난 22일 오후 1시께 서울 을지로 세운상가 3층. 건물 옥상인 이곳엔 3.3㎡ 크기의 철제 가건물 30여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간판조차 없는 이들 점포의 창문에 ‘도청’ ‘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글자로 뭘하는 곳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뭐 찾는 제품 있어요?” 기자가 주위를 서성이자 언제 다가왔는지 40대 초반의 남성 두 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속삭이듯 물었다. “도청장비를 구한다”고 하자 “일단 따라오라”며 사람 두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좁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이들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듯 검은색으로 선탠이 된 미닫이 문을 꽉 닫았다. 익숙한 듯 다른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봤다.
“어디에 쓸거죠. 적당한 걸 권해드릴 수 있는데….” 책상 밑에서 책자 하나를 꺼냈다. 도청기 사진과 제품 설명이 적혀 있는 일본어 책자였다. 그는 “도청기는 손톱보다 작은 것부터 담뱃갑만한 것까지 있다”며 “단순 유선 도청기는 요즘 사용하지 않고 무선통신 방식의 도청기는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했다.
일단 물건을 먼저 보자고 하자 “돈 갖고 오면 그때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기자가 현금을 보여주자 잠시 뒤 어딘가에서 담뱃갑 크기의 도청 송·수신 장비를 꺼내왔다. 일본산 아즈덴(AZDEN)이라는 도청기였다. “소파 틈 등에 잘 갖다두면 반경 50m 안에서는 깨끗하게 들린다”고 자신했다.
도청장치를 찾는 고객도 다양했다. “바람 난 배우자를 잡으려는 사람도 있고, 기업의 기밀정보를 빼내려는 이도 있어요. 올핸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선거 관계자들이 종종 들러서 사가는 ‘선거특수품’입니다. 올해처럼 도청기나 몰래카메라가 많이 팔린 때도 없죠.”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거들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도청기는 4종류. 도청기 가격은 제품 크기와 수신 거리에 따라 다르다. 50만원짜리 무선 도청기 아즈덴은 담뱃갑만한 크기에 50m 거리 안에서 도청이 가능하다. 400만원짜리 도청기 TK 1200은 일회용 라이터의 절반 크기에 최대 300m 거리에서도 도청할 수 있다. 여기서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일본에서 밀수입한 것들이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동전만한 도청기는 많이 유통되는 편은 아니지만, 800만원만 내면 4~5일 내로 일본에서 밀수입한 뒤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선 도청기 판매가 합법이다.
이곳에선 스파이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파이캠은 대당 20만~40만원 선. 넥타이, 단추, 자동차키 등의 형태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상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GPS도 인기다. 대당 120만원가량인 GPS는 한 번 부착하기만 하면 자신의 휴대폰에 상대의 위치가 1분 간격으로 노출된다. 기자가 찾아간 서울 서교동의 GPS 판매업체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 업체 대표는 “방이나 사무실에 몰래카메라와 도청기를 설치하고,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풀세트를 요구하는 의뢰인도 있다”며 “200만원이면 24시간 특정인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귀띔했다.
◆도청 탐지업체 5년 새 2배 이상 늘어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는 법. ‘사생활 엿보기’의 홍수 속에 또 다른 호황 업체도 있다. 도청기나 몰카, GPS 등을 탐지해주는 업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도청탐지 업체 수만 31개에 달한다. 5년 전만해도 13개 업체에 불과했다. ‘돈이 된다’는 소문에 크게 늘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2009년 48대던 불법 감청 적발대수는 지난해 62대로 늘었다. 전국 각지에 있는 탐지업체의 적발 건수까지 합하면 한 해에 수백건의 도청이 적발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탐지업체 한국통신보안의 안교승 대표는 종종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을 방문한다. “선거 유세 때마다 상대 지지자들이 몰려와 방해한다. 선거 유세 일정이 노출되는 등 도청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사를 해달라” 등의 이유로 도청 탐지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안 대표를 찾는 고객은 85%가 기업체이고 나머지는 정치권 관계자다. 덕분에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가 몰려있는 올해 탐지업체들은 대목을 맞았다. 안 대표는 “예약주문 등을 합치면 올 들어 매출이 20%가량 늘었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의 요청에 따라 총리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해 보안 검색을 한 적도 있다. 탐지 비용은 3.3㎡ 당 1만원. 그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제3자의 귀와 눈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여기면 주저하지 않는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규모는 연 200억~300억원대로 추정된다.
◆도청기 불법…몰카,GPS는 단속 어려워
문제는 도청장비 거래가 불법이지만 이를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 사법경찰이 단속을 나가도 판매상들이 불법 도청기를 진열해놓고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손님으로 가장해 도청기 판매현장을 적발하더라도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 없다는 게 관리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도청장치는 설치한 게 발각되더라도 대부분은 누가 설치했는지를 밝힐 수 없어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타인을 추적하기 위해 설치됐다 물의를 빚고 있는 스파이캠이나 GPS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상인들은 “전 제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상품으로 믿고 구매해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 스파이캠은 방통위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적합성 인증은 해당 제품이 제 기능을 하는지, 전자파의 위해성이 있는지 검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적합성 인증을 거친 제품을 구입한 사용자가 제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판매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우섭/하헌형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