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데스크] 앉은뱅이 정의의 여신, 디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병일 지식사회부 차장 kbi@hankyung.com
“대법원에서 빨리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위험 헤지상품인 키코(KIKO)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기가 차다는 듯이 하소연했다. 소송 결과가 재판부에 따라 춤을 추면서 100건이 넘는 관련 소송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투덜댔다. 2010년 11월29일 99개 기업에 패소를 안겼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8월23일엔 4개 기업 모두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업 측 손을 들어준 최승록 부장판사는 20여명 판사들의 공부 모임인 ‘증권법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이 모임은 판결 직전에도 기업과 은행 양측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하는 등 꾸준히 파생상품 관련 지식을 쌓아왔다.
이렇게 쌓은 내공으로 독일 이탈리아 등 외국의 최신 사례를 원용한 것이 판결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어쨌든 재판장만 달라졌을 뿐 같은 1심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의 결론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 케이스는 더 가관이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난 사건을 포함해 2건의 뇌물사건에 휘말렸는데,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검찰수사관 신화’를 써가던 그의 정치경력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는 시장 재직 시절인 2007년 안산시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3월2일 구속됐으며 1, 2심에서 모두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5월13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날 때까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1년2개월여.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썼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요약하면 하급심 법원의 증거 채택이 엉망이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법권이 날로 커지면서 ‘사법 통치’라는 말까지 나온다. 행정부도 국회도 다툼이 생기면 검찰로, 법원으로 달려간다. 변호사들은 사건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법원은 사건의 홍수 속에서 북적인다. 문제는 판사들의 실력이나 책임의식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데 있다. ‘분쟁의 해결사’가 아니라 종종 ‘분쟁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가카새끼짬뽕’ 판사나 ‘가카빅엿’ 판사는 저리 가라고 할 ‘서초동 스타일’의 소신 판사와 언제든 법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대의명분보다 퇴임 후 ‘물 좋은’ 개업지 물색이 요즘 판사들에게 더 관심사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일부 판사들의 안하무인격인 자세는 요지부동이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최고 우위에 있는 양 “반성이 없다”며 피고인을 윽박지르기 일쑤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대법정 입구 위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다. 그런데 원본과는 약간 변형된 모습이다. 오른손에 든 저울은 같은데 왼손에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우리 법체계가 서양과 달리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임을 보여준다.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은 대부분 서 있는 반면, 우리는 앉아 있다. 안정감은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난다. 발로 뛰지 않는, 가만히 앉아서 검찰이 갖다주는 신문조서에 의지하는 우리 사법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김병일 지식사회부 차장 kbi@hankyung.com
환위험 헤지상품인 키코(KIKO)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기가 차다는 듯이 하소연했다. 소송 결과가 재판부에 따라 춤을 추면서 100건이 넘는 관련 소송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투덜댔다. 2010년 11월29일 99개 기업에 패소를 안겼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8월23일엔 4개 기업 모두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업 측 손을 들어준 최승록 부장판사는 20여명 판사들의 공부 모임인 ‘증권법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이 모임은 판결 직전에도 기업과 은행 양측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하는 등 꾸준히 파생상품 관련 지식을 쌓아왔다.
이렇게 쌓은 내공으로 독일 이탈리아 등 외국의 최신 사례를 원용한 것이 판결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어쨌든 재판장만 달라졌을 뿐 같은 1심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의 결론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 케이스는 더 가관이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난 사건을 포함해 2건의 뇌물사건에 휘말렸는데,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검찰수사관 신화’를 써가던 그의 정치경력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는 시장 재직 시절인 2007년 안산시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3월2일 구속됐으며 1, 2심에서 모두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5월13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날 때까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1년2개월여.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썼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요약하면 하급심 법원의 증거 채택이 엉망이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법권이 날로 커지면서 ‘사법 통치’라는 말까지 나온다. 행정부도 국회도 다툼이 생기면 검찰로, 법원으로 달려간다. 변호사들은 사건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법원은 사건의 홍수 속에서 북적인다. 문제는 판사들의 실력이나 책임의식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데 있다. ‘분쟁의 해결사’가 아니라 종종 ‘분쟁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가카새끼짬뽕’ 판사나 ‘가카빅엿’ 판사는 저리 가라고 할 ‘서초동 스타일’의 소신 판사와 언제든 법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대의명분보다 퇴임 후 ‘물 좋은’ 개업지 물색이 요즘 판사들에게 더 관심사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일부 판사들의 안하무인격인 자세는 요지부동이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최고 우위에 있는 양 “반성이 없다”며 피고인을 윽박지르기 일쑤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대법정 입구 위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다. 그런데 원본과는 약간 변형된 모습이다. 오른손에 든 저울은 같은데 왼손에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우리 법체계가 서양과 달리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임을 보여준다.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은 대부분 서 있는 반면, 우리는 앉아 있다. 안정감은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난다. 발로 뛰지 않는, 가만히 앉아서 검찰이 갖다주는 신문조서에 의지하는 우리 사법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김병일 지식사회부 차장 kbi@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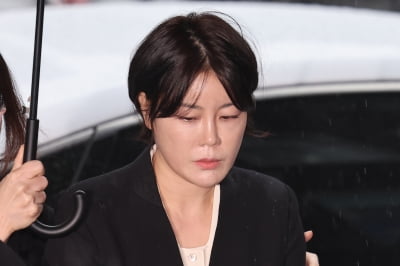
![특허법인 설립한 지평... 세종은 공공조달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4674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