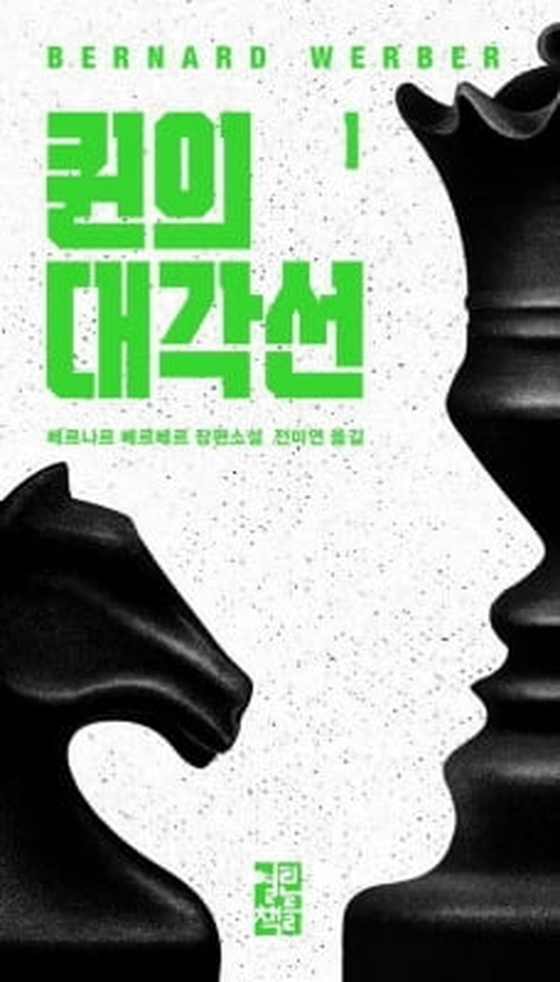[다산칼럼] 구름 걷히면 청산이거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객원논설위원 jwan@khu.ac.kr >
과거에는 로스차일드와 같은 일이 매우 흔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반사람들은 과거의 왕과 귀족들보다 훨씬 더 청결한 환경에서 살고, 능력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평균 수명도 과거에 비해 두 배 이상 길어졌고 유아 사망률도 뚝 떨어졌다.
이처럼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19세기 초에 나왔던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 창발됐다. 자유주의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자유롭다는 정치적 신념이다. 이 자유주의는 사유재산, 재화 및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주창하며, 경제적으로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대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자유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사회는 잘살게 되고 빈곤에서 벗어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으로 풍요해졌다. 과거와는 달리 예술가들이 왕이나 귀족과 같은 단 한 명의 후원자나 고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됐다. 클래식 음악 이외에도 펑키, 블루스, 재즈 등 다양한 장르가 출현했고,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보헤미안이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존재하게 됐다.
그런데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그 사회가 특정한 계층을 위한 사회인 것처럼 오도했다. 그가 그렇게 인식했던 것은 자유주의 초기 노동자들의 궁핍한 삶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들의 궁핍한 삶은 대부분 그 이전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여하튼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고약하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 자신의 부만을 생각하는 냉혹한 자본가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 눈을 멀게 해 인신매매, 마약, 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고 말한다.
이런 시각은 최근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에 대한 영화평론들에서도 드러난다.
‘피에타’는 돈 때문에 인간과 가족이 파괴되는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라고들 한다. 돈 때문에 인간과 가족이 파괴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탐욕 때문이지 어떻게 자본주의 때문인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자본주의 때문이라면 시대적 배경이 자본주의 이전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도 자본주의 때문인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자본주의가 자본가만을 위한 사회라는 인식 때문에 자본주의는 항상 개혁의 대상이다. ‘짐승의 얼굴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무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버전인 양 자본주의1.0, 2.0, 3.0, 4.0을 이야기한다.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자본주의 개혁은 정부의 권력을 키울 뿐이다. 정부권력이 커지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우리의 삶이 정치권력을 가진 소수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검열과 지시를 받게 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경제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피에타’와 같은 영화가 나오기도 어려울 수 있다. 불평등도 커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정치권력이 강한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 소수의 사람만이 핵심적 권력자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다가가야 할 대상이다.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해 시스템을 자본주의, 즉 자유주의 이념이 잘 실현되는 사회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 보인다.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객원논설위원 jwan@khu.ac.kr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사람경영, 경영자의 삶은 책임이다 [한경에세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881997.3.jpg)
![[기고] 초여름 실종사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탄소중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162090.3.jpg)
![[한경에세이] 대학+실버타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86123.3.jpg)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168235.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