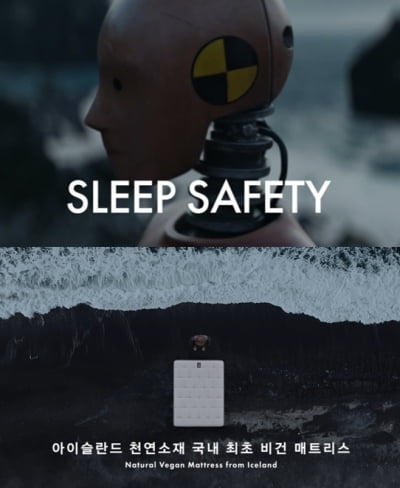웅진 사태로 본 법정관리 제도의 4가지 문제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커버 스토리 - 법정관리의 그늘
(1)오너 책임 안묻고 경영권 유지…워크아웃보다 지분 덜 뺏겨
(2) 신청전 사주 사익 챙길 가능성 우려
(3) 사후관리 부실로 재무상황 더 악화되기도
(4) 채무기업 단독 신청으로 채권단 불만
(1)오너 책임 안묻고 경영권 유지…워크아웃보다 지분 덜 뺏겨
(2) 신청전 사주 사익 챙길 가능성 우려
(3) 사후관리 부실로 재무상황 더 악화되기도
(4) 채무기업 단독 신청으로 채권단 불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기업 부도에 따른 파장을 줄이고 기업에 회생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채무만 탕감받으려 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단을 중심으로 이를 악용할 여지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정관리의 문제점을 4가지 쟁점별로 정리해본다.
◆워크아웃보다 낮은 대주주 감자 비율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대주주들은 경영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감자(자본금감축)를 실시한다. 대주주 지분을 줄임으로써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정관리 기업 대주주의 감자 비율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대주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다보니 기존 주주를 우대해 온 결과다. 감자 이후 한국알미늄 대주주 지분율은 95.0%에서 31.8%로, 신일정공 대주주 지분율은 70.8%에서 44.2%로 각각 줄었다. 감자 후 지분율이 30%를 넘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엔 대주주 지분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워크아웃 기업의 감자 비율은 이보다 훨씬 크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의 대주주 지분율은 40.7%에서 0.8%로 낮아졌다. 금호타이어의 대주주 지분율도 58.0%에서 0.4%로 줄었다. 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대주주들은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선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모임인 ‘생법회’의 회장을 역임한 노주혁 현대엘리베이터 전무는 “법정관리 후에도 기존관리인유지(Debtor In Possession) 제도에 의해 부실 책임이 있는 기업 대주주가 대부분 관리인을 맡다보니 판사를 설득해 감자 비율을 낮추거나 인사권을 휘두르며 각종 이권을 챙기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악용되는 DIP 제도
DIP 제도는 ‘환자(부실 기업)’를 유치하기 위한 ‘병원(법원·채권단)’ 간 경쟁이 붙으며 2006년 법원에서 야심차게 내놨다. 변동걸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돼 미국식 제도를 도입했다.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기존 경영진이 책임지고 회사를 회생시키라는 좋은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은 회사가 많다. 대주주가 최고경영자(CEO)인 기업이 상당하다. 이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에도 DIP 제도에 따라 횡령 등 범법행위가 없으면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풍림산업의 경우 총수인 이필웅 회장과 이필승 부회장 형제가 물러났다. 하지만 이 회장의 아들 이윤형 사장이 계속해서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된 미국은 다르다. 전문경영인이 법정관리인으로 일하며 빠르게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GM과 크라이슬러 등이 대표적이다.
조규홍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실 팀장은 “DIP 제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기존 사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 정상화 늦어질 가능성
법정관리 후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을 빨리 정상화시키기보다 관리인이 지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회생을 고의로 지연시켜 재무상황이 악화된 사례도 많다.
1분기 중 5개 주요 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 폐지 및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20개에 달했다. 회생불가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이 중 15개 기업의 관리인은 기존 대주주이거나 경영진이다.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늦추다가 회사를 망하게 한 경우다.
법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이르면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임광토건은 5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2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조기 졸업하기도 했다.
정준영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는 “LIG건설, 임광토건 등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패스트트랙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의 취지는 좋지만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100% 수용되지 않아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너무 느슨한 법정관리 신청 조건
법정관리 신청 조건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채무자(기업)가 단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호 협의 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미국과 다르다. 그러다보니 웅진홀딩스처럼 채권단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도 나온다. 뒤통수를 맞은 채권단으로선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신진기 우리은행 기업개선본부장은 “법정관리 전에 자금을 빼돌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웅진그룹 같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법정관리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대주주 가족 일가의 불법자산 은닉 여부나 세금탈루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승두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법정관리를 아무나 신청하지 못하도록 DIP 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DIP 제도 시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부실화 되기 전 조기 신청 때 △채권단이 동의할 때 △현 경영진이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을 때 등 3가지 조건 아래서만 한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