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모순, 경제민주화만으로 어렵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저성장 시대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산업· 계층간 소득 불균등 심화를 대증적(對症的) 진단인 경제민주화로만 봐서는 전체적 이해와 올바른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신문로 S타워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2차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만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가계부채, 건전한 복지정책과 같은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새삼스럽게 헌법 제119조2항을 거론하며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경제민주화라 불릴만한 규제와 조정을 강력하게 해왔다"며 우리가 어떤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직접세는 지나치게 민주화됐다"면서 "중소기업에 160개에 달하는 혜택을 부여한 중소기업보호정책은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재벌 규제 정책과 관련해 김 교수는 "미국 등은 하나의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시장집중'에 대해 규제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특이하게도 기업 규모가 큰 '일반집중'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분분한 것과 관련, "한국의 사회와 문화가 안고 있는 특질이 정치에 해결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사회와 문화의 특질로 공동체로 조직되지 않고 분산적 개인으로 구성된데다 물질주의 취향이 강해 갈등과 모순을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흡수 또는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교수는 "대선 정국을 맞아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대증적인 화두를 내걸고 유권자의 표를 구하는 역사적 배경은 이같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hopema@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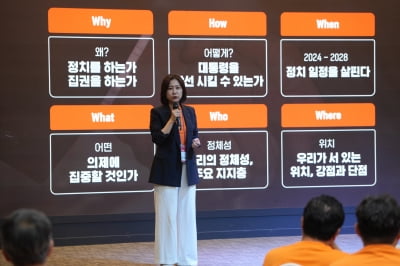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168235.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