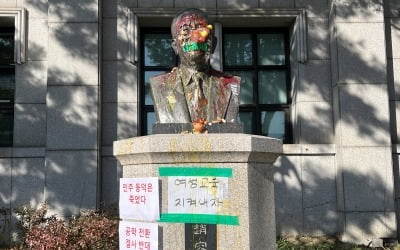[노동 포퓰리즘 시대] BMW 근로자 35%가 비정규직…폭스바겐은 파견회사 직접 운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上) 일자리 가로막은 노동법안 (下) 유연한 선진국 고용시장
한국서 불가능한 전환 배치
독일서는 공장內는 물론 다른 회사간에도 활발
노동시장 유연화 적극 추진
유로존 위기때 극복 '원동력'
한국서 불가능한 전환 배치
독일서는 공장內는 물론 다른 회사간에도 활발
노동시장 유연화 적극 추진
유로존 위기때 극복 '원동력'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생산 시설 중 하나다. 2005년 설립된 독일 내 최신생 차 공장인 이곳은 첨단 설비와 함께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1001가지 건축물’과 같은 버킷 리스트에 들 정도로 현대적 디자인으로도 유명하다.
무엇보다 자동차 업계가 이곳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고용 구조에 있다. 전체 5500명 직원 중 35%인 1900여명이 파견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 자동차 공장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독일 자동차 업계 평균(10%대)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단순히 수치만 높은 게 아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공장이 초창기에는 정규직 위주로 운영하다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데 비해 이 공장은 아예 첫 가동 때부터 비정규직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고용 패턴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톡톡히 빛을 봤다. 좌파성향의 노동사회학자인 하요 홀스트 프리드리히 실러대 교수조차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유로운 인력 조정으로 독일 자동차 업체 중 가장 효과적으로 비용을 감축한 공장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했다. BMW 라이프치히 공장은 독일 제조업체의 노동 유연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독일은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 폭스바겐 인사담당 임원 출신인 페터 하르츠가 중심이 된 노동시장 개혁위원회의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기간을 폐지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했다. 통일 독일 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임금·저근로 시간 등의 탓으로 대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한때 ‘유럽의 병자’로까지 추락했던 독일이 유로존 위기의 최고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독일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이 100% 출자한 인력 제공 업체 ‘아우토비전’도 독창적인 모델이다. 자동차 업체가 별도 자회사로 인력 업체를 운영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아우토비전은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독일 내 21곳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폭스바겐, 아우디 등 폭스바겐그룹에 1만4000여명의 파견 및 도급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다. 폭스바겐과 아우토비전의 관계를 프로야구에 비교하면 흡사 1군과 2군격의 역할에 가깝다. 폭스바겐 근로자가 경기 악화로 생산량이 줄거나 개인적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되면, 아우토비전으로 옮겼다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폭스바겐이나 같은 계열의 아우디 등에서 다시 일할 수도 있는 구조다.
아우토비전 사업장평의회의 알리 나히 의장은 “폭스바겐이 아우토비전을 두게 된 것도 결국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실업자를 줄일까 하는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성이 최고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강성 노조의 영향으로 한 공장 내에서 라인 간 전환배치도 거의 불가능한 데 반해 독일에서는 회사 간 전환배치까지 이뤄지고 있다. 회사 간 협약을 통해 업종별 경기 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트럭업체인 MAN과 고속철 및 발전장비 회사인 알스톰의 독일 지사 간에는 인력 구조조정시 상대방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협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협약이 맺어진 곳은 브라운슈바이크에 10개사를 비롯해 하노버에 9개사, 괴팅겐에 4개사 등이 있다.
독일 니더작센주 사용자협의회(경총)의 노르베르트 라이너스 부회장은 “독일은 1990년대 말 이후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안됐다”며 “유연성을 높여 위기시에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호황시에는 정규직의 숙련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노버·볼프스부르크=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