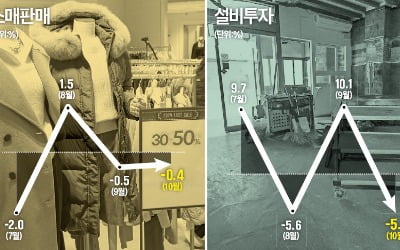박석순 환경과학원장 "개발은 곧 환경파괴라는 인식 바꿀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 신문고' 에코벨 1년
지역·계층간 환경불평등 심화
환경권 누구든 동등하게 누려야
찾아가는 서비스 '에코벨' 활용을
지역·계층간 환경불평등 심화
환경권 누구든 동등하게 누려야
찾아가는 서비스 '에코벨' 활용을
“환경문제와 관련해 국내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개발은 곧 환경파괴’라는 것이죠.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소득층까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환경평등권 실현은 어려워집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환경연구소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첫 민간인 출신 수장인 박석순 원장(55·사진). 취임 1년을 맞아 정부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느낀 국내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먼저 인식의 틀부터 깨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환경권을 바로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인 첫 환경과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환경과학원장을 맡았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환경철학을 제공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1년간 정부 일을 하면서 국민 사이에 환경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환경권은 이미 1980년 헌법에 명문화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환경권 보장에 소홀했고 국민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30여년간 사장되다시피 했어요.”
박 원장은 “국내 환경운동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기여했지만 너무 극단적 환경이념에 빠져 국가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상당 부분이 이상적 환경주의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주변에서 정체 모를 악취가 난다거나, 소음이 발생했을 때 즉각 이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환경민주화입니다.”
박 원장은 취임 직후 도입한 일종의 ‘환경 신문고’인 ‘에코벨(Eco-Bell)’ 제도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에 불편을 느낄 경우 전화 한 통만 하면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컨설팅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마쳤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및 소득 계층 간 환경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원장은 “에코벨 제도는 국민에게 환경권 보장을 폭넓게 알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며 “환경서비스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 환경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토대”라고 덧붙였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물질 누출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탐지 장비가 환경과학원(인천) 보유 특장차 한 대가 유일하다보니 대응이 늦었습니다. 이 차 한 대 값이 10억원입니다.” 국민의 환경 기대치는 높아진 것에 비해 투자엔 여전히 인색한 국내 현실도 문제라고 그는 꼬집었다.
30여년간 환경 연구를 통해 8건의 환경특허를 보유하고, 강과 호수 연구로 유일하게 이달의 과학기술자 상을 받은 박 원장. 그는 “가난이 환경의 최대 적이고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킨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홍성호 기자 hymt4@hankyung.com
그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1년간 정부 일을 하면서 국민 사이에 환경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환경권은 이미 1980년 헌법에 명문화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환경권 보장에 소홀했고 국민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30여년간 사장되다시피 했어요.”
박 원장은 “국내 환경운동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기여했지만 너무 극단적 환경이념에 빠져 국가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상당 부분이 이상적 환경주의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주변에서 정체 모를 악취가 난다거나, 소음이 발생했을 때 즉각 이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환경민주화입니다.”
박 원장은 취임 직후 도입한 일종의 ‘환경 신문고’인 ‘에코벨(Eco-Bell)’ 제도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에 불편을 느낄 경우 전화 한 통만 하면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컨설팅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마쳤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및 소득 계층 간 환경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원장은 “에코벨 제도는 국민에게 환경권 보장을 폭넓게 알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며 “환경서비스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 환경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토대”라고 덧붙였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물질 누출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탐지 장비가 환경과학원(인천) 보유 특장차 한 대가 유일하다보니 대응이 늦었습니다. 이 차 한 대 값이 10억원입니다.” 국민의 환경 기대치는 높아진 것에 비해 투자엔 여전히 인색한 국내 현실도 문제라고 그는 꼬집었다.
30여년간 환경 연구를 통해 8건의 환경특허를 보유하고, 강과 호수 연구로 유일하게 이달의 과학기술자 상을 받은 박 원장. 그는 “가난이 환경의 최대 적이고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킨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홍성호 기자 hymt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