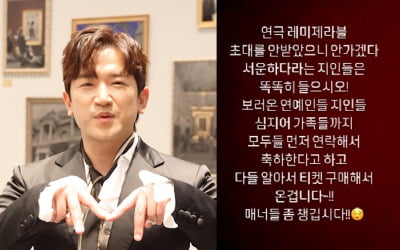[책마을] 진정한 승자 되려면 '협력 DNA'를 키워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죄수의 딜레마' 기초한 실험통해 '집단선택' 등 협력의 법칙 제시
지구적 문제 해결에 단초 제공
배고픈 동료와 피 나누는 박쥐 등 자연계 '협력' 사례도 담아
초협력자
마틴 노왁 외 지음 / 허준석 옮김 / 사이언스북스 / 496쪽 / 2만원
지구적 문제 해결에 단초 제공
배고픈 동료와 피 나누는 박쥐 등 자연계 '협력' 사례도 담아
초협력자
마틴 노왁 외 지음 / 허준석 옮김 / 사이언스북스 / 496쪽 / 2만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이 두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다윈 진화론의 성전은 처절한 생존 투쟁으로 얼룩져 있다. 보다 많이, 오래 살아남기 위한 개체들의 ‘피 칠갑을 한 이빨과 발톱’이 난무한다.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정의한 대로 ‘적자 생존’의 무자비한 무대다.
마틴 노왁 하버드대 교수는 다윈의 진화론은 마지막 세 번째 요소를 놓쳤다고 주장한다. 세포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실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으로 가득한 생태계에서, 다른 개체를 위한 협력과 자기 희생의 미덕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하버드대 진화동학프로그램의 책임자이기도 한 노왁 교수는 《초협력자》에서 삶이라는 게임에 임하는 개체들이 ‘이기적인 동기’라는 금과옥조를 거스르고 어떻게 경쟁 대신 협력을 만들어 내는지 탐구한다.
지구 생태계의 갖가지 ‘협력’ 사례를 추적해온 저자는 “협력은 지구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창발적이고 건설적인 힘이고, 인간은 협력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할 줄 아는 존재”라며 “진화의 창조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협력이 제3의 원칙이 돼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죄수의 딜레마’란 틀을 기초로 한 실험을 토대로, 배신과 갈등을 넘어 협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법칙을 제시한다. ‘직접 상호성’ ‘간접 상호성’ ‘공간 선택’ ‘집단 선택’ ‘혈연 선택’이다.
직접 상호성은 ‘주고받는’ 원칙이다. 이번에 베푼 만큼 다음에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자연에서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산호초 안에서 큰 물고기를 청소해 주는 작은 물고기, 어렵사리 먹고온 피를 굶주린 옆 동료에게 나눠주는 흡혈박쥐, 비공식적인 휴전을 유지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의 군인들에서 이 법칙이 발견된다. 직접 상호성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반복해서 접촉하는 게 필요하다. 작은 공동체에서 직접 상호성을 통한 협력이 잘 작동하는 까닭이다.
위험에 처한 큰가시고기의 행동에서도 ‘주고받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큰가시고기는 강꼬치고기 같은 포식자가 나타나면 이 포식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접근한다. 두 마리의 큰 가시고기가 접근할 경우 상대가 보조를 맞추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포식자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다.
간접 상호성은 ‘평판의 힘’으로 얘기할 수 있다. 상대에게 선의를 베풀면, 상대가 아닌 주변의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선의를 돌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간접 상호성은 근대 공동체의 확대와 경제적 교환을 통한 연결망 구축, 세밀한 분업화를 가능케 했다. 특히 언어를 포함, 수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인간의 뇌를 진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공간 선택은 한 영역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은 서로 협력의 진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누구나 이웃한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내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간다. 이 법칙은 배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를 지은 협력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인간이 이 협력의 5가지 법칙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종, 즉 초협력자라고 말한다. 협력은 언어에서 도덕, 종교, 민주주의에 이르는 고도의 사회적 행동을 창발시킨 진화의 가장 능숙한 설계자이자 힘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협력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공해, 자원고갈, 기아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협력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마틴 노왁 하버드대 교수는 다윈의 진화론은 마지막 세 번째 요소를 놓쳤다고 주장한다. 세포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실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으로 가득한 생태계에서, 다른 개체를 위한 협력과 자기 희생의 미덕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하버드대 진화동학프로그램의 책임자이기도 한 노왁 교수는 《초협력자》에서 삶이라는 게임에 임하는 개체들이 ‘이기적인 동기’라는 금과옥조를 거스르고 어떻게 경쟁 대신 협력을 만들어 내는지 탐구한다.
지구 생태계의 갖가지 ‘협력’ 사례를 추적해온 저자는 “협력은 지구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창발적이고 건설적인 힘이고, 인간은 협력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할 줄 아는 존재”라며 “진화의 창조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협력이 제3의 원칙이 돼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죄수의 딜레마’란 틀을 기초로 한 실험을 토대로, 배신과 갈등을 넘어 협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법칙을 제시한다. ‘직접 상호성’ ‘간접 상호성’ ‘공간 선택’ ‘집단 선택’ ‘혈연 선택’이다.
직접 상호성은 ‘주고받는’ 원칙이다. 이번에 베푼 만큼 다음에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자연에서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산호초 안에서 큰 물고기를 청소해 주는 작은 물고기, 어렵사리 먹고온 피를 굶주린 옆 동료에게 나눠주는 흡혈박쥐, 비공식적인 휴전을 유지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의 군인들에서 이 법칙이 발견된다. 직접 상호성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반복해서 접촉하는 게 필요하다. 작은 공동체에서 직접 상호성을 통한 협력이 잘 작동하는 까닭이다.
위험에 처한 큰가시고기의 행동에서도 ‘주고받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큰가시고기는 강꼬치고기 같은 포식자가 나타나면 이 포식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접근한다. 두 마리의 큰 가시고기가 접근할 경우 상대가 보조를 맞추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포식자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다.
간접 상호성은 ‘평판의 힘’으로 얘기할 수 있다. 상대에게 선의를 베풀면, 상대가 아닌 주변의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선의를 돌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간접 상호성은 근대 공동체의 확대와 경제적 교환을 통한 연결망 구축, 세밀한 분업화를 가능케 했다. 특히 언어를 포함, 수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인간의 뇌를 진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공간 선택은 한 영역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은 서로 협력의 진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누구나 이웃한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내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간다. 이 법칙은 배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를 지은 협력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인간이 이 협력의 5가지 법칙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종, 즉 초협력자라고 말한다. 협력은 언어에서 도덕, 종교, 민주주의에 이르는 고도의 사회적 행동을 창발시킨 진화의 가장 능숙한 설계자이자 힘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협력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공해, 자원고갈, 기아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협력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