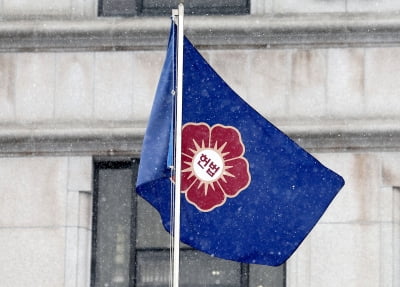[사설] 박근혜 정부 방향성 드러내지 못한 인수위 출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구상하는 국정 핵심 이슈들을 정리하고,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정권 인수·인계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MB정부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국정 기밀자료 등을 넘겨받지 못해 출범 초기 곤욕을 치렀던 것 같은 불상사가 재연될 리야 없겠지만,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는 게 정권 교체다.
인수위 출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장 인선만 해도 그렇다. 인사 배경에 대해 어떤 철학과 의미가 담겼는지 설명이 없다 보니 이런저런 의문과 추측이 쏟아진다. 일부 위원들은 자신이 왜 발탁됐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식이니 더욱 그렇다. 뒷말이 많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물론 박 당선인의 고민을 모르지는 않는다. 인맥과 이해관계에 발목을 잡힐 일 없는 실무형 전문가로 인수위를 구성한 것만 봐도 그렇다. 줄서기, 권력다툼, 논공행상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말라는 경고일 것이다. 명함을 노린 자문위원을 두지 않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는 공감이 간다. 박 당선인이 인사에서 유난히 철통보안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인수위 멤버와 구조만 봐서는 박근혜 정부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방향을 짐작하기 어렵다. 행복추진위원회 멤버들이 3분의 1이나 기용됐다지만 철학과 이념이 제각각이다.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가치를 얼마나 깊숙하게 공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관료 출신도 마찬가지다. 소위 여야를 넘나들며 광폭 인맥을 다져왔던 마당발들이 눈에 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기어이 박근혜 정부에 상처를 준다.
인수위원 중에는 내각에 들어갈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평판까지 반영하는 마당이다. 이미 일부 인사들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진퇴 논란에 휩싸여 있는 터다. 박 당선인 핵심 참모들은 물론, 인수위원끼리도 잘 모른다는데 국민이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인수위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인수위 출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장 인선만 해도 그렇다. 인사 배경에 대해 어떤 철학과 의미가 담겼는지 설명이 없다 보니 이런저런 의문과 추측이 쏟아진다. 일부 위원들은 자신이 왜 발탁됐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식이니 더욱 그렇다. 뒷말이 많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물론 박 당선인의 고민을 모르지는 않는다. 인맥과 이해관계에 발목을 잡힐 일 없는 실무형 전문가로 인수위를 구성한 것만 봐도 그렇다. 줄서기, 권력다툼, 논공행상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말라는 경고일 것이다. 명함을 노린 자문위원을 두지 않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는 공감이 간다. 박 당선인이 인사에서 유난히 철통보안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인수위 멤버와 구조만 봐서는 박근혜 정부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방향을 짐작하기 어렵다. 행복추진위원회 멤버들이 3분의 1이나 기용됐다지만 철학과 이념이 제각각이다.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가치를 얼마나 깊숙하게 공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관료 출신도 마찬가지다. 소위 여야를 넘나들며 광폭 인맥을 다져왔던 마당발들이 눈에 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기어이 박근혜 정부에 상처를 준다.
인수위원 중에는 내각에 들어갈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평판까지 반영하는 마당이다. 이미 일부 인사들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진퇴 논란에 휩싸여 있는 터다. 박 당선인 핵심 참모들은 물론, 인수위원끼리도 잘 모른다는데 국민이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인수위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