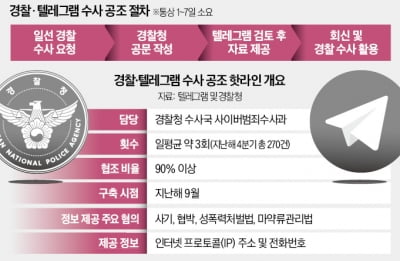사랑은 가도 예술은 남아…명작의 바탕 된 세잔과 모델의 비밀 동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스토리&스토리 - 예술가의 사랑 (36) 폴 세잔
오직 그림 하나밖에 모르던 외골수 화가 폴 세잔(1839~1906). 그도 사랑 앞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변호사가 되라는 은행가 아버지의 끊임없는 압력에도 끄떡없이 버티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바보가 되고 만 것이다.
그를 바보로 만든 여인은 오스탕스 피케였다. 알프스에서 멀지 않은 두메산골 출신의 이 처녀는 장밋빛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아홉 꽃다운 나이에 무작정 상경, 파리의 사설 미술학교인 스위스아카데미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얻기 위해 틈틈이 학생들에게 모델을 서주기도 했다. 시골처녀지만 우윳빛 피부에 새침한 표정을 한 그는 젊은 미술학도 사이에 제법 인기가 높았다.
그러던 오스탕스가 우연히 그곳에 재학 중이던 세잔의 모델을 서게 됐는데 세잔은 그날따라 안절부절못하며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물감은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붓은 팔레트와 캔버스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반나절이 흘렀지만 캔버스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날 세잔은 오스탕스의 모습을 캔버스 대신 마음속에 그렸다.
다음날부터 그는 오스탕스만을 모델로 고용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그림은 그리지 않고 오스탕스만을 바라봤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화가가 되겠다던 그는 뭔가 사태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스탕스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거나, 자신의 여인으로 삼거나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오스탕스를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주저 없이 돌직구를 날렸다.
오스탕스로선 세잔이 자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은행가의 아들과 결혼한다면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의 로맨틱한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그는 세잔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였다. 동상이몽의 결합이었다. 둘은 살림을 합쳤고, 얼마 후 아들이 태어났다.
세잔은 이 사실을 꼭꼭 숨겼다. 모델과 동거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간 아버지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질 게 분명했다. 물론 생활비도 즉시 끊어질 게 뻔했다. 오스탕스로서는 실망이었다. 부잣집 아들이라 많은 생활비가 송금될 줄 알았는데 고작 단칸방에서 두 사람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에 불과했다. 그가 꿈꾸던 도시에서의 호화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루에도 서너 시간씩 부동자세로 남편의 모델을 서야 하는 일이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간 불호령이 떨어졌다. 표정도 바뀌어선 안 됐다. 이 성미 고약한 작가는 부인을 그저 석고상쯤으로 아는 듯했다. 그의 안중에는 오직 그림밖에 없었다. 그래도 오스탕스는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버텨 나갔다.
반면에 세잔은 교양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고 허영에 들뜬 오스탕스와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했다. 뻣뻣하기 그지없고 배려심 없는 이 여인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틈새가 생긴 것은 세잔이 파리를 떠나 남프랑스 에스타크에 정착하면서부터였다.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의 불똥을 피하기 위해 이사한 것이긴 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오스탕스에게 참을 수 없는 무료함을 안겨줬다. 네온사인도 없고, 세련된 카페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나마 둘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유일한 끈은 아들이었다.
세잔이 아버지에게 오스탕스와의 비밀 동거와 손자의 출생 사실을 알린 것은 1876년 편지를 통해서였다. 분노한 아버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불과 몇 달 앞둔 1886년 마침내 둘의 혼인을 승낙했다.
그러나 혼례를 올릴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일말의 애정도 남아 있지 않았다. 법적인 절차는 오직 아들을 배려하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세잔은 6개월 후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곧바로 부인과 별거에 들어간다. 오스탕스는 아들과 함께 엑스 시내에 거주하다 파리로 이주한다. 세잔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 여자는 스위스와 레몬에이드에 대한 열망으로 똘똘 뭉쳤어”라고 비아냥댔다.
세잔의 사랑은 그렇게 스러졌지만 그의 작가로서의 인생은 오스탕스와 헤어지고 난 후 비로소 꽃피기 시작한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외곽에 거주하면서 생 빅투아르산의 본질적 모습을 그리는 데 여생을 바친다. 그는 살아생전 공식 화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아방가르드 작가들 사이에는 신화적인 존재로 기억된다.
그가 사물의 본질적 아름다움에 눈떠 가는 데 있어 오스탕스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그는 오스탕스의 초상을 그리는 가운데 대상의 구조적 아름다움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잔의 수많은 명작은 곧 세잔의 달콤쌉쌀한 사랑의 궤적이기도 한 것이다. 예술은 때때로 사랑의 아픔 속에서 익어간다.
정석범 문화전문기자 sukbum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