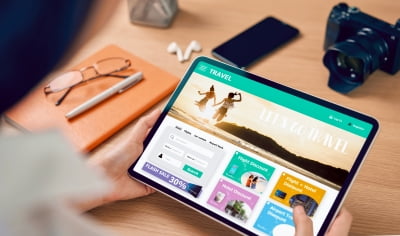[취재수첩] 시장 못 따라가는 간호사제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준혁 중기과학부 기자 rainbow@hankyung.com
요즘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는 여자,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는 간호사는 남자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의사=남자, 간호사=여자’ 공식이 깨졌음을 실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서울 소재 간호대학 입학생의 20%가 남학생이다. 간호대학들은 남자 화장실 늘리기가 한창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국내 남자 간호사가 사상 처음으로 6000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정확히 2013년 현재 6202명이다. 국가시험에 붙은 남자 간호사 합격자 수도 올해 처음 1000명을 넘어섰다. 1962년 남자 간호사가 첫 배출된 지 반세기 만이다. 얼마 전엔 남자 간호사회 발기인 대회도 열렸다. 50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남자 간호사가 됐던 조상문 씨(78)는 “간호사를 천직(天職)으로 삼으면 후회할 일이 없다. 머지 않아 남자 중에 간호협회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확실히 이제 ‘백의(白衣)의 천사’라고 해서 여자만 떠올리면 곤란한 시대가 됐다.
남자 간호사 증가는 그만큼 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간호사에 대한 전문인력 활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 중 2년의 석사과정을 더해 방문간호, 응급분야, 감염 관리, 마취, 중환자, 종양 전문 등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가 양성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은 이들의 채용을 꺼린다. 전문간호사들의 활동이 건강보험 의료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병원 측 부담이 가중되는 탓이다.
지난해 전체 간호사(29만5633명) 중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병원을 옮긴 간호사가 수만명이나 된다. 처우가 열악해 병원 간 이직이 잦다. 어렵게 전문간호사가 돼도 찬밥 신세다. 전문간호사 활용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며칠 전 복지부는 2018년 간호조무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직 간호조무사들에 대해선 경력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식 간호사로 등재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간호업계는 시큰둥하다. 서울 H병원의 한 간호사는 “정부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의료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숫자만 늘리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의 인력 구성과 수요는 빠르게 변해가는데, 의료환경과 제도는 저만큼 뒤처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준혁 중기과학부 기자 rainbow@hankyung.com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국내 남자 간호사가 사상 처음으로 6000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정확히 2013년 현재 6202명이다. 국가시험에 붙은 남자 간호사 합격자 수도 올해 처음 1000명을 넘어섰다. 1962년 남자 간호사가 첫 배출된 지 반세기 만이다. 얼마 전엔 남자 간호사회 발기인 대회도 열렸다. 50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남자 간호사가 됐던 조상문 씨(78)는 “간호사를 천직(天職)으로 삼으면 후회할 일이 없다. 머지 않아 남자 중에 간호협회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확실히 이제 ‘백의(白衣)의 천사’라고 해서 여자만 떠올리면 곤란한 시대가 됐다.
남자 간호사 증가는 그만큼 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간호사에 대한 전문인력 활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 중 2년의 석사과정을 더해 방문간호, 응급분야, 감염 관리, 마취, 중환자, 종양 전문 등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가 양성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은 이들의 채용을 꺼린다. 전문간호사들의 활동이 건강보험 의료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병원 측 부담이 가중되는 탓이다.
지난해 전체 간호사(29만5633명) 중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병원을 옮긴 간호사가 수만명이나 된다. 처우가 열악해 병원 간 이직이 잦다. 어렵게 전문간호사가 돼도 찬밥 신세다. 전문간호사 활용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며칠 전 복지부는 2018년 간호조무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직 간호조무사들에 대해선 경력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식 간호사로 등재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간호업계는 시큰둥하다. 서울 H병원의 한 간호사는 “정부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의료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숫자만 늘리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의 인력 구성과 수요는 빠르게 변해가는데, 의료환경과 제도는 저만큼 뒤처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준혁 중기과학부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