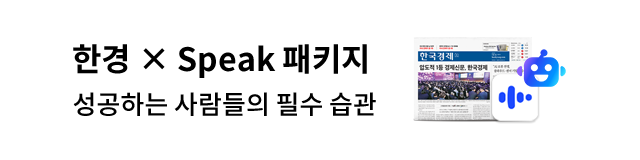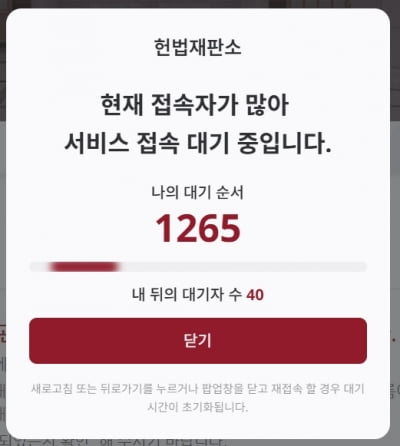총각 예찬론을 펴는 이들은 물론 철학자들이다. 헤라클레이토스와 플라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칸트 쇼펜하우어 니체 등 웬만한 철학자들은 평생 총각이었다. 니체는 철학자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작가 버나드 쇼는 일시적인 망상으로 결혼하는 것이라고 했다. 에릭 클라이넨버그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도 독신이 훨씬 덜 고독하고 더 흥미로운 삶을 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플라톤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으면서도 총각 예찬론에는 반대했다. 그는 혼인을 통한 출산만이 공동체 시민으로서 으뜸의 덕목이라고 하면서 무릇 그리스인들은 35세까지는 결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것은 무솔리니였다. 그는 집권할 때 공무원이나 정치가들은 결혼하든지 아니면 직무를 사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국가가 미혼 총각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이탈리아는 총각세(bachelor tax)를 부과했으며 이에 영향 받아 1930년대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도 한때 유행처럼 총각세를 매겼다.
통계청이 2010년 출생한 남아 5명 중 1명은 결혼도 못한 채 노총각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의 혼인 상태, 남녀성비, 인구구성비 등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한 예측이라고 한다. 2010년 남녀 출생성비는 107 대 100이었다. 남초(男超)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젊은 총각들은 수출하고 신붓감은 수입하자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들릴 날이 멀지 않았다.
자연 생태계에선 성비 균형이 깨져 수컷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죽고죽이는 싸움을 벌여 성비 균형을 이룬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남자들의 수를 줄이는 갑작스런 변고가 있을까 두렵다.
오춘호 논설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