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정성 어린 손님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너나없이 돌·백일 잔치는 호텔에서…사라져가는 전통의 초대문화 아쉬워
이윤신 < W몰 회장·이윤신의 이도 대표 cho-6880@hanmail.net >
이윤신 < W몰 회장·이윤신의 이도 대표 cho-6880@hanmail.net >
정성 어린 손님상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트렌드에서 벗어난 이야기처럼 들리는 요즈음이다. 얼마 전까지 집들이, 백일상, 돌상, 생일상 등의 잔치를 집에서 했지만 이제는 서비스 업체로 초대하는 것이 유행이 됐다. 그 추세에 휩쓸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카뮈는 스승인 장 그르니에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이 광란 속에서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붙잡고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 많은 가치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최소한 우리에게 책임 있는 가치들만이라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카뮈가 스물다섯 때 일이다. 카뮈의 다짐을 읽으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돌아보게 된다. 집에서 치르던 여러 초대 행사들이 밖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맞벌이 탓에 시간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입시 위주의 교육과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어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인가, 집에서 준비하자니 복잡하고 귀찮아서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에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과시욕이 더한 것인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나는 백일과 돌에 가족이 아닌 손님들을 호텔에 모아 파티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백일과 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호화롭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부담을 주며, 행사가 번잡하여 참가한 하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지도 못한다.
모든 문화현상은 수용과 발전과정을 거쳐 진화한다지만 우리의 한식당은 언제부터인가 많이 변질되었다. 고급 한식당일수록 한 음식을 먹고 나면 또 하나 음식을 내놓고 마지막에 “식사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된장찌개, 누룽지, 온면 중에 고르시면 돼요” 하고 묻는다. 한식이 코스로 나오게 된 것은 서양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일본에서 유입된 것일까.
우리 사회는 예전부터 손님을 접대할 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는 전통이 있었다.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주인은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말한다. 요즘은 “차린 건 없지만”이라는 말을 듣기 어렵게 됐다.
외국인 친구가 찾아오면 우리 전통식이라고 소개하며 마땅히 대접할 만한 곳이 없다.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초대문화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윤신 < W몰 회장·이윤신의 이도 대표 cho-6880@hanmail.net >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카뮈는 스승인 장 그르니에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이 광란 속에서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붙잡고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 많은 가치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최소한 우리에게 책임 있는 가치들만이라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카뮈가 스물다섯 때 일이다. 카뮈의 다짐을 읽으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돌아보게 된다. 집에서 치르던 여러 초대 행사들이 밖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맞벌이 탓에 시간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입시 위주의 교육과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어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인가, 집에서 준비하자니 복잡하고 귀찮아서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에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과시욕이 더한 것인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나는 백일과 돌에 가족이 아닌 손님들을 호텔에 모아 파티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백일과 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호화롭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부담을 주며, 행사가 번잡하여 참가한 하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지도 못한다.
모든 문화현상은 수용과 발전과정을 거쳐 진화한다지만 우리의 한식당은 언제부터인가 많이 변질되었다. 고급 한식당일수록 한 음식을 먹고 나면 또 하나 음식을 내놓고 마지막에 “식사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된장찌개, 누룽지, 온면 중에 고르시면 돼요” 하고 묻는다. 한식이 코스로 나오게 된 것은 서양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일본에서 유입된 것일까.
우리 사회는 예전부터 손님을 접대할 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는 전통이 있었다.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주인은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말한다. 요즘은 “차린 건 없지만”이라는 말을 듣기 어렵게 됐다.
외국인 친구가 찾아오면 우리 전통식이라고 소개하며 마땅히 대접할 만한 곳이 없다.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초대문화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윤신 < W몰 회장·이윤신의 이도 대표 cho-6880@hanmail.ne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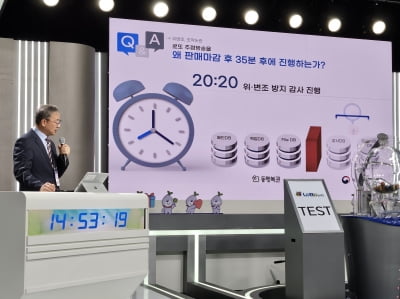
!["로또 조작 못하겠네"…추첨기 어떻게 관리하나 봤더니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3291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