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퇴직연금…3년만에 이자 반토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약속한 금액 줘야하는 기업 부담 갈수록 늘어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 은행들은 이달 1년 만기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해 연 3%대 초·중반의 금리를 제시했다. DB형 기준으로 국민은행은 연 3.15~3.50%의 금리를 주겠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연 3.17~3.52%) 우리은행(연 3.18~3.53%) 하나은행(연 3.20~3.56%) 등도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시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최저 금리는 연 2.84%로 가장 낮았다.
기업들이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2009년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은 연 8% 안팎의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연 5%대 금리가 유지됐지만 지난해 4%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연 3%대로 낮아졌다.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간 데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금리 과당 경쟁에 제동을 건 탓이다.
문제는 금리가 떨어질수록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DB형의 경우 운용수익에 관계없이 약속한 돈을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돈은 퇴직금 계산 규정상 임금상승률만큼 매년 불어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만큼의 운용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만큼 회사 측의 부담이 늘어난다.
"기업들,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 높여야"
한 증권사 퇴직연금 담당자는 “이론적으로 DB형은 연간 운용수익률이 최소 종업원들의 연간 임금상승률 정도는 돼야 한다”며 “대기업의 경우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보통 5% 정도 되기 때문에 연 3% 초·중반 수준의 금리로 운용되면 결국 회사 측이 그 차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작년 말 현재 전체 퇴직연금(67조3459억원)의 73.8%(49조6987억원)가 이 같은 구조를 가진 DB형에 가입돼 있다. 기업들이 이 부담을 피하려면 퇴직연금을 운용수익률에 따라 근로자들의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든지,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타개하려면 DB형 퇴직연금을 실적배당형 상품 등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 하지만 원금까지 날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이마저도 저조하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비중은 2008년 말 82.01%에서 작년 말엔 93.10%로 오히려 높아졌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5.10%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돼 있는 호주(49.7%) 미국(59.8%)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2011년 말 기준)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김동윤/이상은 기자 oasis93@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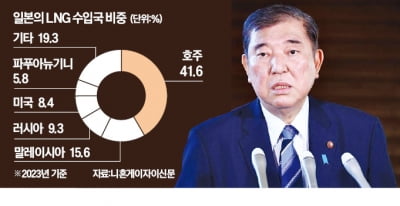
![[단독] 매그나칩반도체 4년 만에 매각 시동…LX·두산·DB 인수 후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3813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