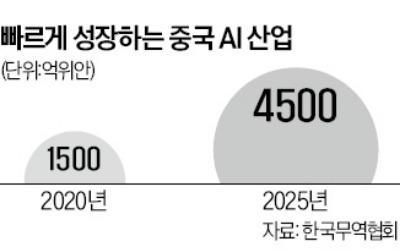[취재수첩] 29년만에 관훈토론회 나온 日 대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미아 국제부 기자 mia@hankyung.com
![[취재수첩] 29년만에 관훈토론회 나온 日 대사](https://img.hankyung.com/photo/201304/01.7366134.1.jpg)
주한 일본대사가 관훈클럽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선 건 1984년 4월 마에다 도시카즈 대사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가는 질문들은 어느 행사보다도 날카롭고 매서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게다가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장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말 부임한 벳쇼 대사의 관훈클럽 토론회 참석은 일종의 모험이었다.
토론회장에선 예상대로 민감한 질문이 쏟아졌다.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것 아니냐”,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등 공격적 질문이 이어졌다.
두 시간 동안 계속된 토론회에서 벳쇼 대사는 어떤 질문을 받아도 옅은 미소를 띤 표정을 단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목소리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일본의 연간 방위비 지출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하다”며 “도쿄 시내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 건 일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결코 위협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그곳에 소녀상을 둔 것이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질문엔 “한·일 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국제법에 입각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벳쇼 대사는 “일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적어도 열흘에 한 번은 한국의 각계 각층 사람들을 만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장을 나가는 벳쇼 대사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그가 18세 때부터 일본 전통극 ‘노(能)’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노’에선 절대 배우가 자신의 표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 각 캐릭터에 맞는 가면을 쓴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벳쇼 대사의 변치 않던 미소를 보며 노의 가면이 생각났던 건 너무 지나친 경계심이었을까.
이미아 국제부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