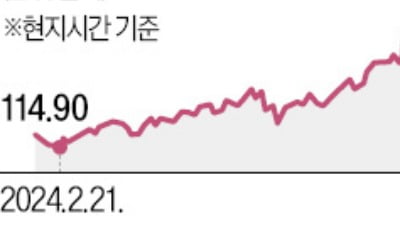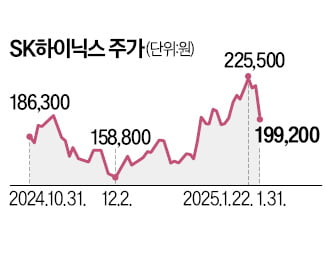삥시장은 한국 유통구조의 허점을 보여준다.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대리점 제도는 한국 유통구조의 뿌리 깊은 시스템이다. 시장이 성장하던 1990년대 이전만 해도 대리점의 위상은 높았다. 지역상권을 쥐고 흔들기도 해 제조업체에 ‘갑(甲)’의 지위를 누리는 대리점도 많았다. 그러나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반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리점의 경영도 어려워졌다. 국내 식품시장 규모는 2009년 40조4080억원, 2010년 34조5480억원, 2011년 40조3180억원으로 연간 35조~40조원에서 정체돼 있다.
게다가 활성화된 대형마트 등과 제조업체가 직접거래를 하면서 대리점의 위상이 쪼그라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이 전체 유통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엔 70% 이상이었지만 요즘엔 60%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는 제조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설정한 판매 목표 이상의 물량을 받지 않는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대리점에 전가된다. 대리점을 맡은 영업사원들은 이전과 같은 판매율을 유지하려 하고, 반면 대리점들은 과도하게 떠안은 물건 때문에 반발하는 갈등은 이런 경영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남양유업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밀어내기’ 또는 ‘푸시(push)’는 그래서 일반적인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업계에 따르면 식품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대리점에 10~20%의 밀어내기 물량을 넘긴다. 밀어내기는 특히 신제품이 나올 때 심해진다. 신제품이 빠른 시간 내 시장에서 자리 잡도록 하려면 출시 초기에 많은 물량을 쏟아내 인지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판매가 부진한 제품에 대해서도 밀어내기가 이뤄진다. 때로는 영업직원이 대리점과 ‘밀약’을 맺고 밀어내기를 한다. 영업직원이 대리점에 밀어내기 물량을 넘기면서 팔리지 않는 물건은 나중에 반품을 받아줄 테니 일단 물건을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밀어내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밀어내기 허용 범위와 반품 규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최만수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