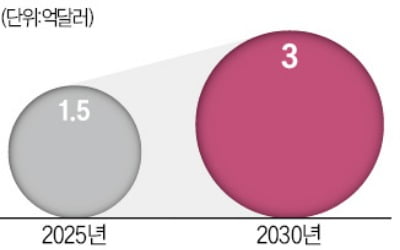무릇 자연은 어머니와 같은 생명체이다. 따라서 장소에 따라 생기의 강약 정도가 다르다. 한눈에 바라보이는 국(局) 내에서 생기가 가장 장(長)한 곳이 혈이다. 풍수의 목적은 묘와 집을 통해 그곳의 생기를 받아 번영을 꾀하려는 것이다.
묘를 쓰면 고인의 유골과 생기가 서로 감응한 결과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복을 전하는데 이를 ‘음택 풍수’라 한다. 집을 지으면 생기가 집안에 머물며 사는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것은 ‘양택 풍수’라 한다.
묘든 집이든 생기가 약한 곳에 터를 잡으면 후손과 사는 사람들이 복 대신 재앙을 입어 흉하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효 사상과 결부돼 음택 풍수가 오랫동안 성행해 왔다.
‘효’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좋은 집, 맛있는 음식, 따뜻한 의복을 갖춰 정성껏 봉양하는 것이다. 돌아가신 뒤에는 길지에 묘를 써 영혼을 편안케 한 뒤 제사를 통해 오랫동안 추모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생전의 지극한 효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고관대작만이 행할 수 있었다. 가난한 백성들의 경우 좋은 집은 고사하고 하루 세 끼 밥조차 올리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산속에 묘를 쓰는 것은 큰돈이 들지 않으니 생전에 행한 불효까지 용서받겠다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길지를 구한 것이다.
국가나 민족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음택과 양택 풍수의 비중을 달리 뒀을 뿐이지 음택이 양택보다 특별히 풍수적 효험이 더 커서 생긴 풍습은 아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튼실하게 열리도록 하려면 비료를 잘 줘야 한다. 음택은 묘 안에 뼈가 존속하는 한 고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치 나무 뿌리와 줄기에 양분을 주듯이 범위는 넓으면서 오래도록 지속되지만 힘은 약하다. 그에 반해 양택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국한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범위가 좁고 사는 동안에만 발복이 일어난다고 본다.
자식을 많이 낳지 않고 도시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현대인들은 후손이 부귀를 누리도록 스스로 밀알이 되기보다 우선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래서 양택 풍수를 더 따지는 경향이 있다.
풍수는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래됐지만 화장 문화가 대세인 중국과 일본에선 음택 풍수가 없었거나 배척당했다. 서구에선 대만과 홍콩의 풍수사들이 활약하면서 그들의 주도 아래 양택 풍수만이 각광받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산천의 길흉을 판단하는 음택 풍수가 본래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제희 < 대동풍수지리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