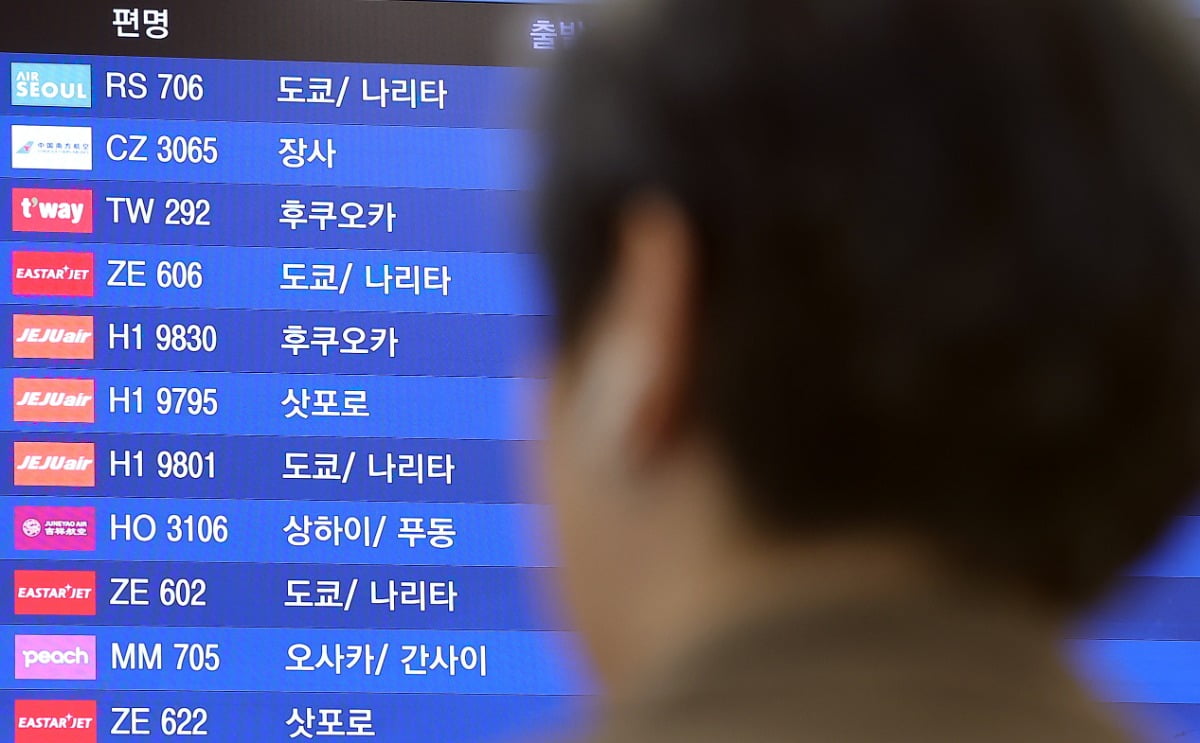[Travel] 빙하의 속살로 채운 쪽빛…만년의 세월 녹아들었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르웨이 백야(白夜) 기행
오슬로 에케베르그 뭉크 '절규' 배경…비겔란 공원, 671개 인물상 눈길
14세기 북유럽 주름잡던 베르겐, 부둣가 목조창고 블록 장난감 같아
네뢰위 피오르의 협곡 시선 압도…204㎞ 송네 피오르 웅장해
오슬로 에케베르그 뭉크 '절규' 배경…비겔란 공원, 671개 인물상 눈길
14세기 북유럽 주름잡던 베르겐, 부둣가 목조창고 블록 장난감 같아
네뢰위 피오르의 협곡 시선 압도…204㎞ 송네 피오르 웅장해

화사한 봄의 절정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면 이제 막 눈이 녹기 시작하는 북국(北國) 노르웨이로 시간을 거슬러 떠나보자.
북대서양을 바라보는 설산들이 ‘하얀 치마’를 7부 능선까지 추켜올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을 준비한다. 항구 도시 오슬로, 베르겐, 스타방에르 노천카페엔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친다.
○대낮처럼 환한 밤, 백야(白夜)의 오슬로

오슬로 항구는 역동적이다. 빙하가 떠난 자리에 바다는 내륙 깊숙이 파고들어 우아한 협곡을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기름진 땅을 남겼다. 고층빌딩이 빼곡하게 올라간 서울이 ‘수직의 도시’라면 오슬로는 바닷가 숲 속에 낮고 넓게 퍼져 있는 ‘수평의 도시’다.
오슬로 중심가인 칼 요한 거리는 관광객과 산책 나온 주민으로 제법 붐빈다. 국회의사당과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시청사,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각국 정상들이 묵는 그랜드호텔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인근의 국립박물관엔 150주년을 맞은 뭉크의 ‘절규’와 ‘마돈나’ ‘병든 아이’ 등 대표작이 전시돼 있다. 뭉크가 ‘절규’한 에케베르그(Ekeberg)의 길은 한적한 외곽이다. 명작의 현장인데도 녹슨 동판 외에는 별다른 기념물도, 관광안내소도 없다. 오슬로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이 경치 좋은 곳에서 천재 화가는 불우한 가정환경에 ‘절규’했다.
오슬로에서 꼭 가볼 곳은 비겔란 조각공원이다. 80에이커에 212개의 조각품과 다양한 표정의 인물상 671개가 ‘인생’을 이야기한다. 아이를 목말 태운 전라(全裸)의 어머니, 어깨동무한 사춘기 소녀들, 같은 곳을 바라보며 두런거리는 노인들, 쓰러진 동료를 부축하는 청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웅변하는 비겔란은 “보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내 작품 설명”이라며 관람객에게 작품 해석의 재량권을 넘겼다.
○베르겐의 그림엽서 같은 풍경

12~13세기 노르웨이의 수도였던 베르겐은 한자동맹이 번성했던 1360년대 북유럽 무역의 중심지였다. 당시 주거래 품목인 말린 대구를 저장한 바닷가 목조창고 ‘브뤼겐’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았다. 브뤼겐은 빨갛고 노란색 벽에 삼각형의 뾰족뾰족한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으로 마치 장난감 레고 블록을 뻥튀기해 놓은 것 같다.
1700년대부터 크고 작은 화재로 여러 번 불탔지만 그때마다 옛날 모습을 다시 살려놓은 집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금은 예술인들의 작업실과 갤러리, 레스토랑, 옷가게가 입주해 있다. 뒷골목엔 이 오래된 목조주택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받침목을 대놓고 군데군데 수리해 가며 낡은 세월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다.
베르겐을 포근하게 감싼 플뢰엔산 전망대에 오르면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이 도시의 명물인 작은 협궤열차를 타고 10분 남짓 가파르게 올라가야 한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베르겐은 탄성을 자아낸다. 쪽빛 바다가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며 육지 쪽으로 좁고 깊게 파고들었다. 육지는 바다 쪽으로 길게 피노키오의 코처럼 튀어나가 빨간 지붕들이 빼곡하다. 산중턱까지 올라온 마을은 한가롭다. 예쁜 그림엽서 같은 풍경이다.

○만년의 시간을 간직한 절경 송네 피오르
베르겐에서 피오르의 계곡 플롬에 가기 위해 오슬로행 기차를 탔다. 기차가 달리는 속도만큼 계절은 다시 겨울로 급박하게 후퇴했다. 눈발이 세차게 차창에 부딪히더니 밖의 풍경은 온통 흰색이다. 두 시간을 달려 뮈르달에서 산악열차를 갈아타자 계절은 다시 봄이다.
플롬은 피오르 사파리로 유명한 에울란 지방의 시골 마을이다. 길이가 204㎞에 달하는 세계 최대 송네 피오르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네뢰위 피오르를 볼 수 있다. 방한복과 방한모, 장갑에 고글까지 중무장하고 보트에 올라 호수를 질주한다.
네뢰위 피오르는 계곡이 워낙 깊고 협곡이 좁아 보기만 해도 숨이 찰 지경이다. 양쪽 협곡은 수영 잘하는 사람이 건널 수 있을 만큼 좁고 가파르다.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의 설원은 햇빛을 받아 자체 발광하는 거대한 형광등이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영화의 엔딩 신이 어울리는 ‘빙하의 속살’이다.
피오르를 끼고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는 버스가 산 고개를 돌 때마다 비가 오고 햇살이 비추는가 싶으면 다시 눈이 내린다. 이곳은 겨울과 봄이 뒤섞여 있다. 도로는 자연의 생김을 그대로 살린 구불구불한 국도다. 길이 끝나는 곳엔 유람선이 있다. 유람선을 타고 하르당에르 피오르를 건널 때 운 좋게 무지개를 볼 수 있었다.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를 닮은 봉우리들 사이로 쪽빛 호수 위에 뜬 무지개는 몽환적이다.
하르당에르의 울렌스방호텔은 이 절경을 객실에서 누릴 수 있다. 1700년대 인심 좋은 사공이 외국인 관광객을 자기 집에 재워주고 극진히 대접한 것이 계기가 돼 시작한 호텔이다. 그 사공의 후예가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음악가 그리그와 소설가 입센이 휴양하던 곳으로 여왕이 해마다 찾아온다.
![[Travel] 빙하의 속살로 채운 쪽빛…만년의 세월 녹아들었네](https://img.hankyung.com/photo/201305/AA.7448119.1.jpg)
예전 선박 수리소를 개조해 꾸며놓은 노천카페 골목과 맞은편 신시가지, 작은 저수지만한 호수공원에 호텔과 쇼핑센터가 밀집해 있다. 평균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달하는 부촌이지만 도심은 천천히 걸어서 두 시간이면 모두 돌아볼 정도로 작다. 노천카페를 겸한 레스토랑엔 오슬로와 마찬가지로 와인과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수다를 떠는 ‘광합성족’으로 붐빈다. 햇살 속에 빛나는 나라, 노르웨이는 그렇게 마음 속에 들어왔다.
오슬로=김규한 기자 twins@hankyung.com
■ 여행 팁
![[Travel] 빙하의 속살로 채운 쪽빛…만년의 세월 녹아들었네](https://img.hankyung.com/photo/201305/AA.7446919.1.jpg)
오슬로의 식당 요리는 대체로 짜다. 첫날 아케르브뤼게 레스토랑에서 먹은 삶은 대구요리는 맥주 한 잔을 털어 넣어도 칼칼한 맛이 목구멍에 진득할 정도였다. 노르웨이의 대표적 음식은 오픈샌드위치다. 호밀 빵 한쪽을 밑에 깔고 연어와 크랩, 새우, 소고기를 듬뿍 얹어 양이 꽤 푸짐하다.
국민 소득이 높은 만큼 물가는 무섭다. 택시 10분에 8만원. 물 한 병에 5000원. 맥주 한 잔에 2만원이다. 시내를 둘러보려면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타고 박물관, 관광지 35곳에 입장할 수 있는 ‘오슬로 패스’가 경제적이다.
24시간 기준으로 성인 1인에 4만3000원. 현지 관광안내소나 호텔에서 살 수 있다. 48시간과 72시간 패스도 있다. 베르겐 카드는 24시간 기준으로 2만4000원. 역시 호텔이나 철도역, 터미널 등에서 사면 된다.
한국 교민은 300여명으로 한국마켓이나 식당은 없다. 노르웨이관광청 한국사무소 (02)777-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