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 '빨간불'…오바마 '큰 정부론' 후퇴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 건강보험 시행 1년 연기
기업반발·중간선거 고려한 듯
기업반발·중간선거 고려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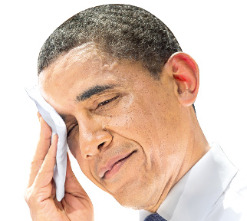
미 재무부는 지난 3일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인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직원의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위반 시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조항의 시행을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 조항이 복잡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오바마 케어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해온 재계는 즉각 환영했다. 식당, 소매업, 농업 관련 중소기업들은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꺼려해 고용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재무부는 기업과 달리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발 후퇴한 만큼 개인의 의무조항을 비롯해 앞으로 대폭적인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의 부작용이 많다는 사실을 백악관이 이제서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공화당)는 “오바마 스스로 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것”이라며 “전술적인 후퇴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레리 자레트 백악관 선임고문은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유연성과 기업의 우려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4년 말 중간선거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공화당에 정치 공세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보조금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건강보험개혁법은 오바마의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특히 자유시장경제보다 정부 역할을 중시하는 오바마의 국정철학인 ‘큰 정부론’의 상징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조항을 연기한 것은 놀라운 결정이며 국정기조의 상당한 후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시장보다 더 영리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오바마의 정치철학이 도전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