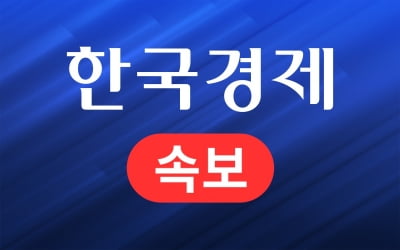[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비교우위와 국제무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3) 비교우위와 국제무역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sejinmin@dongguk.edu >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sejinmin@dongguk.edu >
![[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비교우위와 국제무역](https://img.hankyung.com/photo/201307/02.6942399.1.jpg)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무역의 본질을 생산 효율성에 대한 ‘비교우위’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보자. A나라와 B나라가 있고, 각 나라는 똑같은 쌀과 옷을 생산한다. 그런데 A나라는 쌀 한 가마와 옷 한 벌을 생산하는 데에 각각 한 명씩 필요한 반면 B나라는 쌀 한 가마에 4명, 옷 한 벌에 2명이 필요하다. 쌀 한 가마 생산에 A나라는 옷 한 벌 생산 인력이 필요하지만 B나라는 옷 두 벌 생산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반대로 옷 한 벌 생산에 A나라는 쌀 한 가마 생산 인력이, B나라는 쌀 한 가마의 절반 인력만 요구된다. 이 경우 A나라는 쌀에, B나라는 옷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한다. 언뜻 봐서는 A나라가 두 재화 모두 더 적은 인력으로 생산하고 있어 무역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각 나라의 쌀과 옷 가격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
투입되는 인건비로만 가격이 정해진다고 가정하면 A나라는 쌀 한 가마와 옷 한 벌 값이 같고, B나라는 쌀 한 가마와 옷 두 벌 값이 같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쌀 한 가마로 A나라에서는 옷 한 벌을 살 수 있고, B나라에서는 옷 두 벌을 살 수 있다. 어느 나라의 옷이 싼가? A나라 옷 한 벌이면 B나라 옷을 두 벌 살 수 있으니 B나라 옷값이 싸다. 거꾸로 옷 한 벌로 A나라에서는 쌀 한 가마를, B나라에서는 쌀 반 가마를 살 수 있으므로 A나라 쌀값이 B나라보다 싸다. 각 나라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것이다. 만약 A나라는 쌀을, B나라는 옷을 더 많이 생산해 서로 거래한다면 A나라는 더 싼 값에 옷을 살 수 있고, B나라는 더 싼 값에 쌀을 살 수 있게 돼 ‘윈윈’이 된다.
물론 이런 단순한 시나리오가 현실에 적용되는 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만약 쌀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성이 더 크다고 예상된다면, B나라는 당장은 좀 비효율적이라도 장기적인 경제발전 차원에서 쌀 산업을 보호하고 싶을 것이다. 또한 무역이 시작되자마자 단기간에 쌀을 생산하던 사람이 옷을, 옷을 생산하던 사람이 쌀을 생산하는 인력으로 전환되는 것도 쉽지 않다. 생업을 바꾸는 데에는 현실적인 고통이 매우 클 것이고 소득불균형도 심해질 수 있다. FTA가 환영받으려면 국가 전체의 이득만큼 국내 다양한 집단에 대한 호혜성도 중시해야 한다는 점,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sejinmin@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