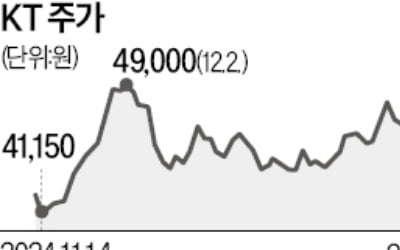삼성서울병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응급실을 열었다. ‘도떼기 시장’ 같은 국내 종합병원 응급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개월간 100억원을 들여 ‘스마트 응급실’을 만들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응급의학과는 물론 각 분야 전문의가 초기 진단부터 치료 결정을 내리기까지 1시간 이내에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공간을 1275㎡에서 1970㎡로 늘렸다. 국내 병원 중 최대 규모다.
응급환자를 위해 단기 입원 병동을 별도로 마련해 입원 병상 13개와 응급 중환자 병상 4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 일일이 묻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진료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부터 대기환자 수와 혼잡도, 체류 예상 시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응급실 운영 시스템을 바꾸기로 한 것은 국내 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200~300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몰려 병상 포화도가 100%를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했다.
조익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장은 “환자들이 얼마나 대기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리던 응급실 풍경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