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60세 정년'이 캠퍼스에 드리운 그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학문보다 취업 고민하는 대학가
고령화시대 일자리갈등 커진 탓
성장과 고용안정의 묘책 찾아야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hih@ewha.ac.kr
고령화시대 일자리갈등 커진 탓
성장과 고용안정의 묘책 찾아야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hih@ewha.ac.kr
![[다산 칼럼] '60세 정년'이 캠퍼스에 드리운 그림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308/AA.7790864.1.jpg)
졸업을 앞두고 스스로를 ‘사(死)학년’이라 칭하는 고학년들 얼굴에 비장함과 결연함이 묻어나옴 또한 익숙해진 지 오래인데, 요즘은 발랄함과 생기로 가득 차야 할 2, 3학년 표정에서도 막연한 불안감과 절박함이 전해져온다. 이유인즉,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남학생의 경우는 09학번 이후부터, 여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11학번 이후부터 졸업과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취업전쟁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 의무화법’이 문제의 주범임은 물론이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되던 당시엔 ‘아버지 일자리 지키려 아들(딸) 일자리 빼앗을 것이냐’는 다소 선정적 이슈가 제기되었다. 분석 결과, 다행스럽게도 청년 노동시장과 고령 노동시장은 거의 중첩되지 않기에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전(戰) 가능성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이란 추론이 힘을 얻었다. 다만 ‘신이 내린 직장’이란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성이 높고 임금 수준도 좋으며 복리후생도 잘 갖추어진 일부 직장의 경우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 충돌 및 갈등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들 막연한 우려가 엄연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지켜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급증하는 중고령 인력의 임금 부담 증가로 인하여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축소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가 희망하는 4~5%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야 정년 연장과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큰 무리 없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경기침체로 인한 2% 내외의 저속 성장에 머문다면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대기업의 7~9배에 이르고 있고 국민경제 기여도 또한 과소평가되어선 안 됨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청년들 입장에선 원하는 직장을 못 구하는 구직난이, 중소기업 입장에선 원하는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우리네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에 주목한다면, 대졸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와 더불어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 감퇴가 이어지면서 청년실업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만든 법안이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강화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듯이, 고령사회에 발맞추어 준비한 60세 정년 의무화가 고용현장에서 뜻밖의 예기치 않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잠복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 조치 이후 야기될 다양한 문제 상황을 추론한 연후에 현실적 대응 방안을 적극 찾아나서는 것이 순리일 터인데, 현재로선 정년 연장 의무화 법안 통과라는 공(功)만 앞세운 채 예상조차 어려운 문제 해결의 책임을 슬며시 기업에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분명 인구구조 고령화에 부응하여 고령 인력의 고용 기회도 확대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활성화를 통해 조직 활력 및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할 것이다.
3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앞서 노동시장 고령화의 길을 걸어간 일본과 유럽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후발 주자로서의 장점을 살려 아버지 일자리와 아들딸 일자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깊은 고민에 빠진 기업현장의 솔직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요, 고령사회의 파고를 넘기 위해 청년 세대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준비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함인희 <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hih@ewha.ac.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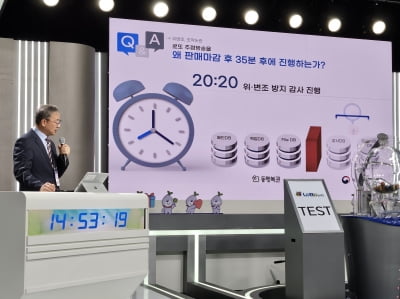
!["로또 조작 못하겠네"…추첨기 어떻게 관리하나 봤더니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3291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