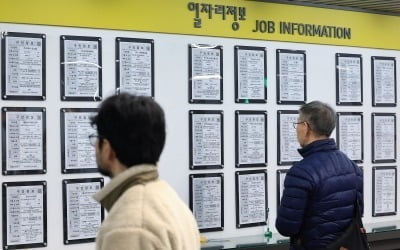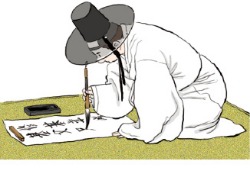
‘숙종실록’에 기록된 이 사건의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고 한다. 조선 중기 이후 시험 부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장에 들어갈 때부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주먹패나 하인 등 선접꾼을 앞세워 몸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사상자가 속출했다니 과거장이 아니라 아수라장이었다. 연암 박지원이 ‘응시자가 수만명인데 서로 밀치고 짓밟아 죽고 다치는 사람이 많았다’며 ‘열에 아홉이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할 정도였다.
3년에 한 번 33명을 뽑는 시험에 10만여명까지 몰렸으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급제가 아니면 출세할 길이 없으니 더 그랬다. 임시 장날에 투전꾼과 건달들이 모여 난리를 피우는 걸 ‘난장판’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북새통을 이룬 과거시험장에서 유래한 것이다. 국가 인재를 뽑는 근엄한 행사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답안지 바꿔치기는 예사였고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채점관을 매수하기도 했다. 대리시험 전문가는 거벽(巨擘)으로 불렸다. 커닝페이퍼를 붓대와 옷 속에 넣어가는 정도는 애교에 속했다. 콧구멍에 쪽지를 숨겨간 사람도 있었다. 응시자가 많아 채점관이 첫 몇 줄만 읽고 일찍 낸 답안지만 보는 폐단 때문에 4~5명이 나눠 쓴 뒤 합쳐서 내는 편법까지 등장했다.
고종 때는 과거를 돈으로 사는 일까지 생겼다. 재정난 때문에 초시 합격증을 200~1000냥에 판 것이다. 이 무렵에 낙방한 이승만·김구 등 가난한 집안 자제들이 기독교와 동학에 각각 투신한 것도 이런 좌절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부정행위를 엄단하는 규정이 없는 건 아니었다. 3~6년간 응시 기회를 박탈하고 곤장 100대와 징역 3년에 처하는 등의 처벌 조항이 있었지만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어제 운현궁에서 열린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에 도포차림의 어르신들이 대거 참여했다. 돗자리 위에서 한시백일장에 열중하는 모습이 진지했다. 시제(詩題)도 ‘한국사교육강화’여서 남의 것을 베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한 외국 어린이가 시험장에 들어가보면 안 되느냐고 아빠를 조르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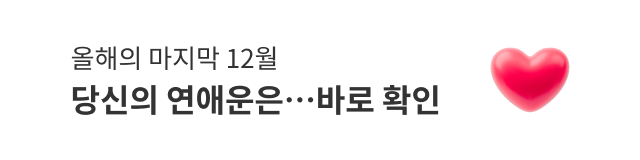
![[한경에세이] 나는 왜 여성을 대변하려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8549302.3.jpg)
![[다산칼럼] 머스크의 '베팅'과 기업의 '컬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29624396.3.jpg)
![[백승현의 시각] 통상임금, 또다른 전쟁의 서막](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1424267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