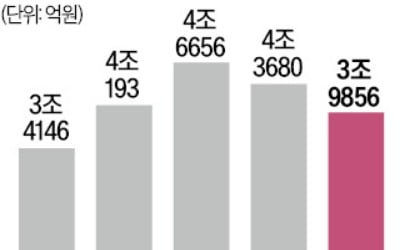[비즈&라이프] 직원 개인사도 챙기는 '큰 형님 리더십'…발로 뛰라며 지점장들에 구두 선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장경영 전도사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회장의 '온실론'
"온실서 살린 부실 금융사…이젠 밖에 꺼내 크게 키울 때"
이 회장의 '온실론'
"온실서 살린 부실 금융사…이젠 밖에 꺼내 크게 키울 때"

그는 김장학 광주은행장, 박영빈 경남은행장,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사장 등 CEO들에게 직접 막걸리를 따랐다. 그리고 “모든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여러분은 나만 믿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막걸리 잔이 몇 순배 돌자 그는 ‘사장’이란 호칭 대신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한 뒤 어깨를 두드려줬다. 계열사 사장들이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답하자 그는 “회장님은 무슨…. 형님이지”라며 혼잣말을 했다.
이 회장은 그룹 내에서 ‘다거(大哥·큰 형님)’로 통한다. 종가집 종손이자 7남매 맏이로 자란 이 회장의 말과 행동은 늘 큰 형님 인상을 풍긴다. 1977년 우리은행 전신인 옛 상업은행 을지로지점에서 말단 행원으로 시작해 37년째 한 은행에서만 근무해온 점도 그런 이미지를 형성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회장의 큰 형님 리더십은 친화력과 겸손함이 묻어나는 따뜻한 인간미에서 나온다. 누구를 만나건 웃는 얼굴이다. 농담도 자주 하고 사생활까지 챙긴다. 특히 이 회장은 직원과 배우자의 상(喪)을 일일이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CEO가 직접 챙겨야 직원들과 그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월 회장에 취임한 직후의 일이다. 본점 지하를 둘러보던 이 회장은 갑자기 건물 관리를 맡은 부서장을 호출했다. 미화원과 청원경찰들의 휴식 장소가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는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한 뒤, 휴식 공간 리모델링 작업을 지시했다.
이 회장의 대표적 경영철학 중 하나는 현장경영이다. 바쁜 스케줄을 쪼개 틈 날 때마다 영업점을 찾는다. 영업점 직원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진솔한 얘기를 이끌어내는 데 천부적이다. 회장 집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고객도 현장에서 만난다. 올 들어서만 벌써 61곳의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지방 중소기업을 방문할 때는 항상 점퍼 차림을 한다. 그러면 금세 격의가 없어진다고 한다. 또 고객을 만날 때면 늘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90도 인사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얼마 전 시화공단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을 때다. 이 회장은 늘 그렇듯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자마자 두 손을 잡고 허리 굽혀 인사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홍보실장이 나중에 이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은 2만여명의 우리금융 직원 대표인데 너무 숙이시는 게 아닌지….” 대답이 걸작이었다. 이 회장은 “당신 같으면 뻣뻣하게 서서 한 손으로 악수하는 은행 사람에게 돈을 맡기거나 빌려 갈 것 같으냐”고 되물었다.
이 회장은 8월 본점 22층 회장 집무실 입구 위에 눈에 띄는 현판을 세웠다. ‘회장실’이란 팻말 대신 나무에 ‘열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랑방’이란 글씨를 새겨 달아놨다. 사랑방처럼 아무 때나 편안하게 들러 얘기를 나누자는 뜻이다. 본인의 명함 뒤엔 ‘고객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문구도 큼지막하게 써놨다. 고객에 대한 이른바 ‘섬김 경영’이다.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짓지만 단호할 때도 있다. 인사를 앞둔 경우다. 그가 회장에 취임하면서 기존 지주사 임원 18명 중 16명이 물러났다. 계열사 CEO도 대거 바뀌었다. 이 회장 스스로도 “가슴이 아팠지만 민영화를 앞두고 있어 인력을 줄이고 조직문화를 다잡기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요즘 이 회장의 최대 현안은 우리금융 민영화다. 경남·광주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계열, 그리고 우리은행 등을 성공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게 이 회장의 주된 임무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직원들 앞에서 성공적인 민영화를 강조할 때마다 ‘온실론’을 꺼낸다.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죽어가는 여러 나무(부실화된 금융회사들)를 하나의 온실(우리금융지주)로 옮겨 살려냈으니 이젠 나무들을 온실 밖으로 꺼내 더 크게 키워야 한다는 게 요지다.
물론 민영화를 앞둔, 마지막 우리금융 회장으로서의 고충과 어려움도 있다. 다른 금융지주들이 그룹의 미래와 시너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회장은 앞으로 흩어질 계열사들을 끝까지 보듬고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최근 전 계열사의 지점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마지막 회장으로서 고뇌를 담은 선물을 했다. ‘구두’였다. 영업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접 뛰어달라는 취지다. 그는 직원들에게 구두를 나눠준 뒤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연인 사이에선 구두가 이별을 뜻하지만 사실 구두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설령 같은 구두를 신고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또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