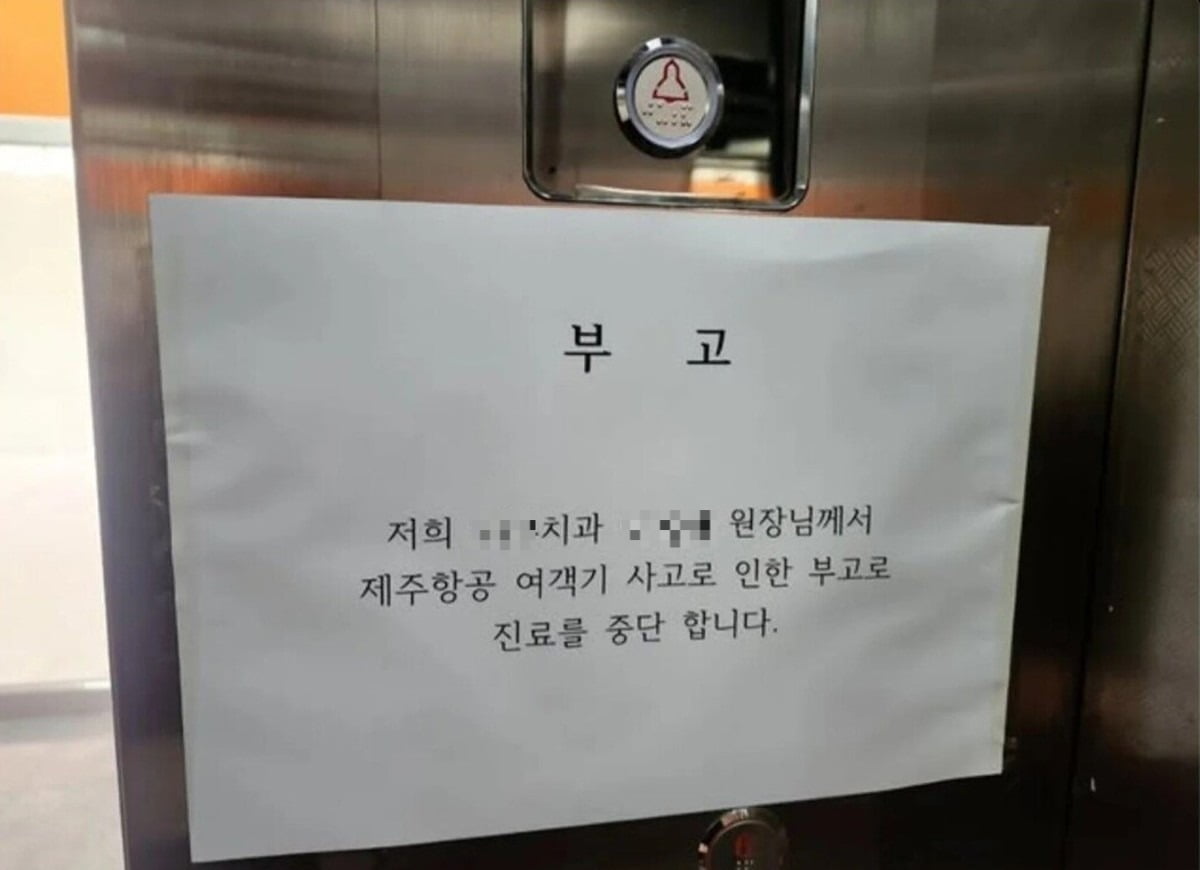삐삐라는 명칭은 기기의 호출 알림음에서 유래했다. 1983년 첫 등장 땐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던 것이 1997년 이용자가 1500만명 이상으로 늘면서 성인들에겐 필수품처럼 인식됐다. 이에 얽힌 사연과 숫자약어도 많았다. ‘1004(천사로부터)’ ‘1010235(열렬히 사모)’ ‘8255(빨리오오)’ ‘1200(지금 바빠요, 일이빵빵)’ ‘0179(영원한 친구)’ 등 기발한 숫자조합들이 등장했다.
연인들은 ‘1004 8282’가 뜨면 설레는 가슴을 안고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다가 길게 늘어선 줄 앞에서 애를 태우곤 했다. 지금 휴대전화로는 느낄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하고 짜릿한 아날로그식 교감이었다. 90년대 중반 문자삐삐가 등장했을 때에도 이동통신사들은 ‘너에게 나를 보낸다. 숫자가 아닌 한글로’ 등의 광고전을 펼치며 연인들을 유혹했다.
목표를 못 채운 영업맨들은 사무실 번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수신이 잘 안 되는 지하에 있었다고 둘러대는 능청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승사자 앞에 끌려가듯 마지못해 전화기를 찾는 소심파였다. 한때는 ‘전자파 때문에 딸만 낳게 된다’는 헛소문이 돌아 삐삐를 등뒤에 차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휴대폰 등장 이후 삐삐는 사양길로 접어들어 병원이나 군대 등에서만 명맥을 이어왔다. 그렇게 추억 저편으로 사라졌던 삐삐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신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정부에 반납된 012 번호는 택시 신용카드 결제 신호로도 되살아나고, 015 번호를 쓰는 서울이동통신은 각 지자체와 상수도 원격검침 계약을 늘려가고 있다.
커피를 주문한 뒤 지루하게 기다리는 불편을 달래주는 ‘진동기’로도 인기다. 언제일지 모르는 차례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음료 나왔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문화를 바꿔보자는 데서 착안했다고 한다. 54개국에 수출까지 한다니 놀랍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삐삐의 재탄생이 반가운 만큼, 새로 펼쳐질 그 역사의 페이지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애환이 아로새겨질지 궁금해진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한경에세이] 저출생과 기업 경쟁력, 다 잡으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9074262.3.jpg)
![[주용석 칼럼] '국장 탈출은 지능 순' 조롱 싫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14477123.3.jpg)
![[천자칼럼] 전쟁 포로 교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907345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