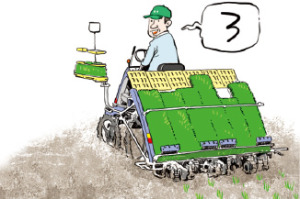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같은 작물을 두 번 이상 수확하는 이기작이나 삼기작이 어렵다. 예외로 제주도에서 생육기간이 짧은 여름 메밀을 3, 7, 9월에 심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흔치 않다. 그나마 가을에 벼를 거둬들이고 보리나 유채, 감자 등을 심는 이모작은 남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것도 경기 남부가 한계선이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전북 익산의 논에서 5~8월 벼, 8~10월 귀리, 11월~이듬해 4월 호밀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삼모작이 가능해진 것이다. 재배 기술의 핵심은 조기 수확 품종인 조평벼와 생장이 빠른 하파귀리를 활용한 것이다. 2015년부터 이 기술을 남부 지역 13만㏊에 보급하면 농가소득이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시범재배 결과 ㏊당 벼 682만원, 하파귀리 276만원, 호밀 139만원 등 1097만원을 얻어 ‘벼+보리’ 이모작 소득(㏊당 811만원)보다 3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삭막한 겨울 들판을 광활한 밀·보리밭으로 바꿀 날이 머지않았다. 식량파동에도 대비할 수 있다. 물론 토양 악화와 병충해, 노동력 증가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는 고령화사회의 인생 삼모작 원리와 닮았다.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은 1948년 48.6세에서 이젠 80세 이상으로 늘었다. 학자들은 2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열심히 일하는 시기를 일모작, 5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까지 사회에 봉사하는 시기를 이모작, 70대 초반 이후 자연회귀 시기를 삼모작 인생으로 나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생 경작에 맞는 일과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거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익히는 경우도 많다. 모두들 제2, 제3의 삶터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다. 일본에서도 고령자들을 ‘신창년세대(新創年世代) 골든에이지’라 부르며 ‘골든 플랜 10개년 계획’ 등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삼모작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와 국가의 수확도 풍성해진다. 이 같은 ‘황금세대’가 좁은 땅을 벗어나 세계 무대로 활동범위를 넓힌다면 더 좋은 일이다.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소도 “인생의 최고 전성기는 중년 이후”라고 했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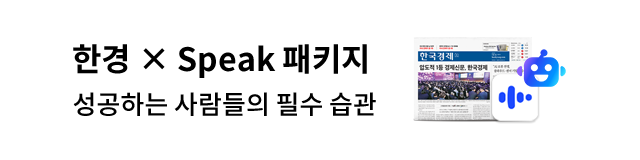
![[한경에세이] 경기회복의 열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73014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