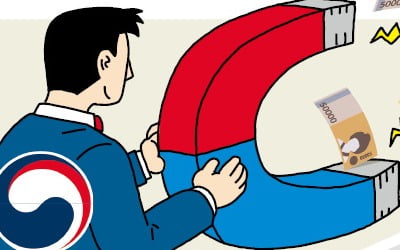반도체처럼…'황의 법칙' 위기의 KT 구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T 새 사령탑 황창규 前 삼성전자 사장 내정
'삼성 1등 DNA' KT에 뿌리내릴지 주목
통신 非전문가…통합의 리더십 발휘가 과제
사외이사들과 심야 회동 사실상 CEO행보 시작
'삼성 1등 DNA' KT에 뿌리내릴지 주목
통신 非전문가…통합의 리더십 발휘가 과제
사외이사들과 심야 회동 사실상 CEO행보 시작

16일 KT 신임 회장으로 내정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성균관대 석좌교수)은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황 회장 내정자는 내년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돼 53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표 통신그룹을 이끌게 된다. 하지만 새 수장을 맞은 ‘KT호(號)’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 이석채 전 회장의 사퇴와 검찰 수사로 인한 이미지 실추, 무선 경쟁력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조직 내분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무선 경쟁력 회복, 탈통신·해외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황 내정자는 이날 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KT 사외이사들과 만나 경영 정상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사실상 회장으로서 행보를 시작했다.
○반도체 성공 신화를 KT에 접목
KT가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황 내정자를 차기 회장으로 낙점한 것은 삼성에서 일군 세계 1위 성공 DNA를 KT에 접목해 글로벌 통신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황 내정자는 이날 KT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최고경영자(CEO) 추천위원회에서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추천위 관계자는 “미래전략 수립과 경영혁신에 필요한 비전 설정 능력, 추진력 및 글로벌 마인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 전문가이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 능력과 비전 실현을 위한 도전정신을 보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장으로서 국가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역임하는 등 ICT 전 분야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도 강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KT 관계자는 “황 내정자가 통신 분야 경험은 없지만 전문가는 KT 내부에도 많다”며 “임직원들과 힘을 합쳐 KT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황 내정자가 정부와 경쟁사 등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선 경쟁력 회복이 과제
KT의 주력 사업인 통신 분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황 내정자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휴대폰 보급 확대로 집 전화 사용이 줄면서 KT는 매달 300억~400억원씩 유선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성장 엔진인 무선사업에서도 가입자 감소와 가입자당 매출(ARPU)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경쟁사보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가 6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무선 경쟁력과 유통망이 크게 약화됐다. KT 통신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14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급감했고, ARPU도 3만1332원으로 전분기 대비 0.9% 감소했다. SK텔레콤(3만4909원)은 물론 LG유플러스(3만4495원)보다 적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무선 경쟁력을 회복해 통신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는 것이 새 회장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비(非)통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KT그룹의 사업구조를 재편했다. BC카드, 스카이라이프, 금호렌터카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통신과 금융·미디어의 시너지를 꾀했다. 하지만 통신 분야 부진을 비통신 계열사 실적으로 메우는 데 급급했다. 따라서 통신과 비통신의 시너지를 강화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올레KT’(이 전 회장이 영입한 사람)와 ‘원래 KT’(기존 임직원)로 분열된 조직을 통합하고 흐트러진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