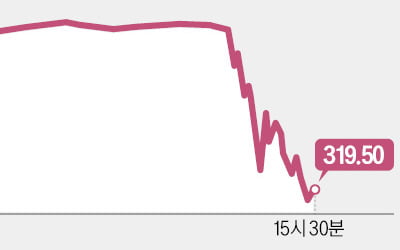['新금융권력' 사모펀드] "국회·시민단체에 정부 내에서도 반대…재벌·론스타 트라우마와 힘겨운 싸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입 주역들은
토종자본 육성 취지…김석동 "100% 달성"
토종자본 육성 취지…김석동 "100% 달성"
![['新금융권력' 사모펀드] "국회·시민단체에 정부 내에서도 반대…재벌·론스타 트라우마와 힘겨운 싸움"](https://img.hankyung.com/photo/201401/01.8271636.1.jpg)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PEF제도 초안을 발표하니 여야,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 내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시선이 삐딱했다”며 “10년 전 상황을 복기해보면 당시 제기됐던 비판들은 대부분 기우였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으로 PEF 도입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 실무를 총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엔 PEF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어깃장을 놓았으니 억울했다”며 “하지만 외국 투기자본에 대항하는 토종 자본을 육성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100% 달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PEF 도입을 반대했던 측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였다. 대기업들이 은행이나 다른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한국에서 굳이 투기자본을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였다. 당시 담당과장(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이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은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퍼진 ‘재벌 트라우마’ ‘론스타 트라우마’와 싸우는 게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국회를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 전 위원장에게 “과천 청사에 올 생각하지 말고 국회에서 살아라”며 독려했다. 실무적 관점에서는 벤치마크할 법과 제도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난관이었다. 선진국에서는 PEF가 사적 계약과 관행을 통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투자 계약서와 업계 관행을 조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당시 담당 사무관으로서 제도의 얼개를 짰다. 민간에서는 김성용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당시 법무법인 우현 변호사), 서종군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장(자산운용협회 법규팀장), 정한설 스틱 부사장(상무) 등이 도움을 줬다.
제도 도입 후에도 시행착오가 많았다. 2004년 말 1호 사모펀드를 등록한 미래에셋은 펀드 등록 단계에서 투자자(LP)들로부터 자금을 먼저 받았다가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투자자금의 60%를 1년 이내 경영권 참여 목적의 지분 매입에 써야 한다는 시행령 조항 때문이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수석조사역이었던 박재흥 금융감독원 사모펀드팀장은 “투자 한도를 먼저 약정한 뒤 투자 단계에서 자금을 받으면 문제될 게 없는 조항이었는데 투자자들이 당장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우겨서 발생한 에피소드”라고 전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中, 동남아와 협력 확대…"전기차·태양광株에 호재"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3092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