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이 흐르면서 디즈니 공주도 달라졌다. 에리얼(1989년 ‘인어공주’), 벨(1991년 ‘미녀와 야수’)은 한결 자유분방해졌다. 백인 일변도에서 아랍 공주(1992년 ‘알라딘’의 재스민), 인디언 공주(1995년 포카혼타스), 중국 공주(1998년 ‘뮬란’의 뮬란), 흑인 공주(2009년 ‘공주와 개구리’의 티아나)로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디즈니 공주에겐 왕자, 아니면 적어도 잘생긴 남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디즈니의 53번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Frozen)’부터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렌델 왕국의 자매공주 엘사와 애나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며, 얼음을 녹일 진실한 사랑이 굳이 남자일 필요도 없다. 드림웍스의 ‘슈렉’(2001년)이 한껏 조롱한 디즈니 공식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
‘겨울왕국’은 전 세계에서 8억달러를 번 연초 최대 흥행작이다. 국내에선 개봉 18일 만에 600만명을 넘겨 애니메이션(‘쿵푸팬더2’ 506만명) 및 뮤지컬영화 흥행기록(‘레미제라블’ 591만명)을 이미 깼다. 2~3번 관람은 흔하고, 심지어 7번 봤다는 중독자도 있다.
이 영화의 강점은 뭐니뭐니해도 빼어난 음악이다. 장정들이 얼음을 가르는 도입부는 ‘레미제라블’의 ‘Look down’과, 자매공주는 뮤지컬 ‘위키드’와 닮았다. 실제로 엘사의 노래는 ‘위키드’의 초대 엘파바인 이디나 멘젤이 불렀다. 국내 음원차트를 석권한 주제곡 ‘Let it go’를 25개 언어로 이어 놓은 음원도 이채롭다.
요즘 문화코드의 대세인 북유럽신화가 짙게 깔려 있는 점도 ‘겨울왕국’의 또 다른 매력이다. 장엄하고 비극적인 북유럽 신화는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그리그의 ‘페르귄트’, 그리고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탄생시켰다. ‘겨울왕국’은 노르웨이의 풍광을 배경으로 담았고, 괴물 트롤을 귀여운 돌요정으로 만들었다.
잘 만든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한국의 겨울을 녹였다면, 미국에선 우리 애니메이션 ‘넛잡:땅콩 도둑들’이 흥행수익 5000만달러를 올리며 박스오피스 2위의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문화와 감성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기고] 잇따른 공사장 화재, 준공 전 안전진단으로 막아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780617.3.jpg)
![[한경에세이] 한 끼의 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39705237.3.jpg)
![진실이 신발 신는 중 거짓은 지구 반을 돈다 [고두현의 문화살롱]](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78002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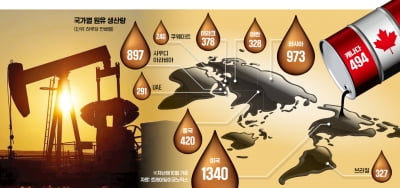

![[속보]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3.1802382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