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를 위한 미술산책] 조선백자, 티끌 한 점 없는 순백의 美…검소한 조선 사대부들 푹 빠졌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석범 문화전문기자의 CEO를 위한 미술산책 (33)

고미술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대체 무슨 백자 한 점이 그리 비쌀까 하며 저마다 입을 딱 벌렸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도자기의 대표 주자는 고려청자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흰색의 백자는 화려한 색채 외 기법을 자랑하는 고려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볼품없는 소박한 그릇으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도자기 역사를 살펴보건대, 백자는 청자보다 고난도의 제조 기술을 요하는 고급스러운 그릇이다.
일단 백자는 청자보다 굽는 온도가 더 높아 1300~1350도를 유지해야 하고 유약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청자는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있지만 백자는 티 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들반들하다.
조선시대에 백자가 만들어진 것은 국내외적인 요인들이 결합된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청자가 쇠퇴하고 백자가 도자기의 대세로 자리 잡는다. 여기에는 도교와 불교를 숭상했던 당나라를 대신해 주자학을 숭상한 송나라가 들어선 정치적 변화도 한몫했다. 주자학자들은 외적인 허식을 지양하고 내적인 수양과 검소한 삶을 지향했다. 순백의 티끌 한 점 없는 백자는 그런 세계관을 뒷받침하기에 적당한 그릇이어서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송의 백자는 주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새 왕조를 연 조선의 왕실 및 사대부의 이상과 기질에도 잘 들어맞았다. 세조가 광주에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을 설치하고 백자를 생산토록 한 것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백자는 고려청자가 그랬듯이 중국의 백자와는 다른 조선만의 미감을 창출해낸다. 완만하고 부드러운 형태감과 해학적인 그림은 조선 고유의 것이다.
백자는 문양이 그려지지 않은 순백자와 그림이 그려진 백자로 나뉜다. 순백자의 맛은 군더더기 없는 단순한 형태감과 유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세한 색조의 변화에 있다. 흰색이라고 해서 다 같은 흰색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며시 푸른색을 띠기도 하고 은근히 회색이 감돌기도 한다.
그 미묘하면서도 담담한 맛은 하루아침에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담백한 맛과 본질적인 미감을 지향하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 얻어진다. 음악애호가가 최종적으로 바하의 본질미에 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 장식도 없고 비대칭인 백자 달항아리 앞에서 넋을 잃는 모습을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림이 그려진 백자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크게 청화백자, 철화백자, 진사백자로 나뉜다. 이 중 가장 고품격의 청자는 회회청(回回靑·코발트블루)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청화백자였다. 회회청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고가의 재료였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자 한때 회회청 대신 산화철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철회(鐵繪)청자라고 한다. 청화백자와는 다르게 그림이 갈색을 띠게 된다. 또 산화동을 사용해 그림이 붉은색을 띠는 백자를 진사(辰砂)백자라고 한다.
![[CEO를 위한 미술산책] 조선백자, 티끌 한 점 없는 순백의 美…검소한 조선 사대부들 푹 빠졌네](https://img.hankyung.com/photo/201402/AA.8367303.1.jpg)
정석범 문화전문기자 sukbumj@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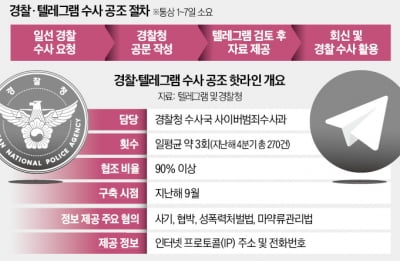
![[포토] 올 행운·건강 기원하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38126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