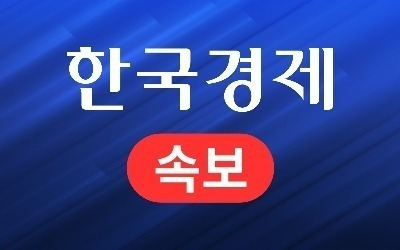[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공허한 성장동력 타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博 hs@hankyung.com
![[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공허한 성장동력 타령](https://img.hankyung.com/photo/201402/02.6938183.1.jpg)
쿤은 패러다임이 바뀌면 아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된다고 봤다. 지금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같은 잣대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공약불가능하다(incommensurable)’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이른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는 총체적 세계관의 변화요, 종교적 개종과 흡사하다고 말할 정도다.
패러다임 바꾸자고?
정권이 바뀌면 새 패러다임을 외치며 성장동력 리스트를 제시하는 게 관행처럼 됐다. 이번에도 어김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내세우며 ‘미래성장동력 9+4’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분위기다.
1990년 초 노태우 정부가 이른바 ‘G7 프로젝트’를 제시했을 때 반짝했던 국민적 관심은 그후 줄곧 내리막길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이 부처 간 알력으로 잠시 뉴스를 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조차도 관심 밖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혹자는 말이 성장동력이지 뭐 하나 눈길을 끌 만한 게 있느냐고 말한다. 차라리 ‘미래부’를 ‘현실부’로 바꾸라는 비아냥이다. 역대 정부 성장동력과 비교하면 들락날락이거나 형용사만 고쳐 붙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전시회(CES)의 부스 명칭을 그대로 옮겼다는 혹평도 들린다. 어쨌든 좋다. 어차피 정부가 미국, 유럽, 일본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리라고 기대한 건 아니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정부 말대로 이게 새 패러다임을 이끌 기술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단순한 하나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익숙한 기술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는 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간 일대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 함몰된 정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말한 ‘이노베이터의 딜레마(innovator’s dilemma)’도 실은 쿤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 패러다임의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 패러다임 혁신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무서운 얘기다. 그래서 기업들은 바짝 긴장한다. 기존의 루틴(routine) 조직이나 시스템으로는 새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별동대다 뭐다 온갖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새 패러다임을 떠들기만 할 뿐 정작 자신은 기존 패러다임을 철저히 고수한다. 법·제도는 요지부동이다. 새 패러다임의 기술 관점에서 보면 기존 패러다임 그 자체가 거대한 규제 덩어리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 패러다임의 기술이 나와도 바로 죽는다.
정부가 제시할 건 기술 리스트가 아니다. 그런 건 기업이 더 잘 안다. 차라리 정부는 성장동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리스트를 내걸라. 정부가 규제만 확실히 없애면 내 돈 내고 투자하겠다는 기업가가 줄을 설 것이다. 정부 돈 타먹기에 눈이 벌건 사람들의 굿판은 이제 끝낼 때도 됐다.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博 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