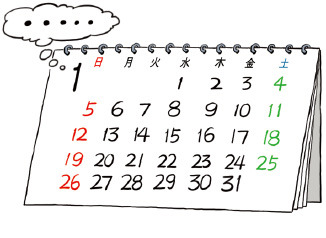
달력 때문에 생긴 해프닝은 무수히 많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46년이 무려 445일이나 됐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 태양력(1년 365일)과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 한꺼번에 90일의 윤일을 넣은 것이다. 그 전까지는 달의 공전주기를 따라 1년을 355일로 삼고 2년마다 윤년(378일)을 뒀다.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보니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윤년을 제멋대로 정하는 부작용까지 생겼다.
고대 문명에서 달력은 농사와 수리, 과세 등의 기준이 되는 국가표준이었다. 권력자들이 이를 통제하려 한 것은 당연했다. 카이사르는 새로 만든 달력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율리우스력이라 했다. 한 해의 시작을 3월에서 1월로 바꾸고 7월의 명칭도 퀸틸리스에서 율리우스(Julius)로 바꿨다. 이것이 영어 ‘July’(7월)의 기원이다.
뒤이어 권력을 잡은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이름을 8월(August)에 넣었다. 8월의 날짜가 율리우스의 달보다 적다는 이유로 2월에서 하루를 빼 보태기도 했다. 이쯤 되면 권력이 달력에서 나왔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튼 이 ‘달력의 권력’은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미세한 편차 때문에 날짜가 맞지 않아 16세기 말에는 약 10일의 오차가 생겼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13세가 만든 게 지금의 그레고리력이다. 교황은 1582년 10월4일 다음날을 10월15일로 조정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날 부활축일을 맞도록 했다. 그리고 4년에 한 번 윤년을 둬 1년이 365.2425일이 되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테두리까지 둘러 멋있게 만든 달력이라도 새해가 되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시대가 바뀌면 정부 정책도 그에 맞게 바꿔야지 예전에 잘 맞았다고 올해도 쓰겠다면 그건 헛수고라는 얘기다. 이른바 달력론으로 재탕삼탕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맞다. 헌 달력은 무용지물이다.
옛날 부채장수와 달력장수 얘기가 생각난다. 몰래 모아둔 부채로 훗날 어려움에 처한 남편을 도운 부채장수 아내와 몇 년 뒤에 있을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겠다며 그 해의 달력을 부지런히 모아두는 달력장수 아내 말이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비즈니스 인사이트] 조직 생존을 좌우하는 리더 승계의 중요성](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4789894.3.jpg)
![[김나영의 교실, 그리고 경제학]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하라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8510855.3.jpg)
![[윤혜준의 인문학과 경제] 새해에도 자유무역의 혜택 계속 누릴 수 있기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289519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