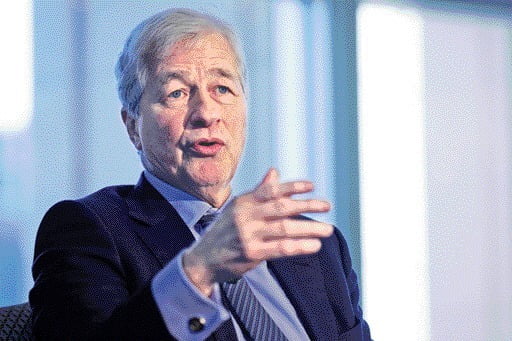[사설] 모순되는 목표와 과제를 해결할 방법론 있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빠진 것 (3)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상충되는 과제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분야별로 세세한 단기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탓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 개혁 등 난제에다 역대 정권이 못 푼 숙제들까지 망라한 결과다.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과제들 간 선택과 집중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쪽에선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다른 쪽에선 1000조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관리를 강조하는 것부터 그렇다. 세부대책이란 것이 집을 사도 대출, 전세도 대출, 월세도 대출 지원이다. 차라리 대출 활성화 대책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부채는 늘어난다.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경기의 활성화처럼 읽힌다. 공공기관 개혁을 한다면서 정작 방만·부실경영의 원천인 공무원 개혁은 없다. 그러니 낙하산 근절책이 되레 정치인, 전관들의 낙하산 자격증이 되는 것이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추진하는데 민간은 없고 온통 정부 주도의 지원책만 나열해 놓고 있다. 공무원이 혁신과 창조를 이끈다는 것은 일종의 형용 모순이요 인지부조화다. 세계 젊은이를 사로잡는 K팝이나, 지구촌 어린이들의 친구 뽀로로가 정부 지원 덕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국회 간 상충이다.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라고 쓰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고 읽는데,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대기업 규제, 시장 개입’이라고 오독한다. 그러니 아무리 규제개혁을 강조해도 국회에선 뭉텅이 규제입법을 쏟아내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관료들의 낡은 관치관행도 대통령의 의지와 모순된다. 법적 규제보다 더 뿌리뽑기 힘든 게 행정지도, 권고·지침, 협조요청 등 보이지 않는 규제라는 게 기업들의 이구동성이다.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사고가 터지면 무관한 규제까지 얹어 규제 덩어리를 만들고, 이를 한 건으로 계산하는 규제분식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전경련의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부당한 저항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밑에서 시끄러우면 대화나 소통, 사회적 합의로 풀자는 것도 논리의 모순이다.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합의와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언어적 관행이라고 보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언제나 목소리 큰 세력이 이긴다. 그런 상충되는 부분을 풀어갈 세련된 방법론이 필요하다.
한쪽에선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다른 쪽에선 1000조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관리를 강조하는 것부터 그렇다. 세부대책이란 것이 집을 사도 대출, 전세도 대출, 월세도 대출 지원이다. 차라리 대출 활성화 대책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부채는 늘어난다.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경기의 활성화처럼 읽힌다. 공공기관 개혁을 한다면서 정작 방만·부실경영의 원천인 공무원 개혁은 없다. 그러니 낙하산 근절책이 되레 정치인, 전관들의 낙하산 자격증이 되는 것이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추진하는데 민간은 없고 온통 정부 주도의 지원책만 나열해 놓고 있다. 공무원이 혁신과 창조를 이끈다는 것은 일종의 형용 모순이요 인지부조화다. 세계 젊은이를 사로잡는 K팝이나, 지구촌 어린이들의 친구 뽀로로가 정부 지원 덕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국회 간 상충이다.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라고 쓰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고 읽는데,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대기업 규제, 시장 개입’이라고 오독한다. 그러니 아무리 규제개혁을 강조해도 국회에선 뭉텅이 규제입법을 쏟아내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관료들의 낡은 관치관행도 대통령의 의지와 모순된다. 법적 규제보다 더 뿌리뽑기 힘든 게 행정지도, 권고·지침, 협조요청 등 보이지 않는 규제라는 게 기업들의 이구동성이다.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사고가 터지면 무관한 규제까지 얹어 규제 덩어리를 만들고, 이를 한 건으로 계산하는 규제분식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전경련의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부당한 저항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밑에서 시끄러우면 대화나 소통, 사회적 합의로 풀자는 것도 논리의 모순이다.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합의와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언어적 관행이라고 보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언제나 목소리 큰 세력이 이긴다. 그런 상충되는 부분을 풀어갈 세련된 방법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