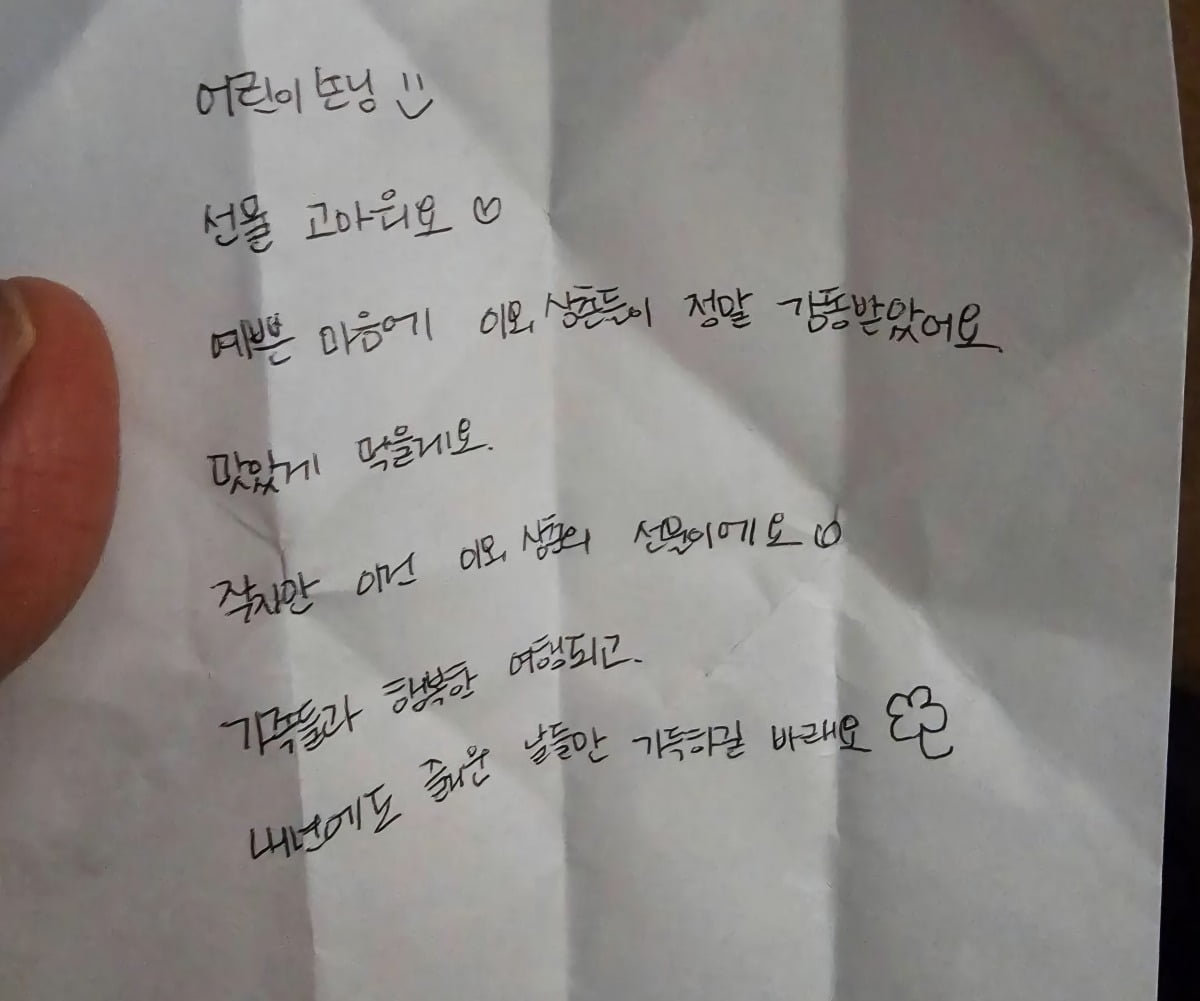부모들은 코딩을 미래 직업 선택의 수단 아니라
세상을 더 재밌게 살고 더 멋진 곳으로 바꿔주는 능력으로 가르쳐

기술 중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엔지니어들이 의사 혹은 변호사 못지않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리콘밸리 기업 근무자들의 평균 연봉은 10만7395달러(약 1억1500만원)였다. 성과에 따라 연봉에 준하는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고,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을 하면 2~3배씩 몸값이 오르기도 한다. 뜨는 벤처기업에서는 인턴직원에게도 600만~7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있다.
가정 교육뿐 아니라 학교와 기업 간 교류도 활발하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직위가 올라가거나 회사 규모가 커졌다고 ‘은둔자’가 되지 않는다. 기업가들은 학교에서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실패 경험도 나눈다. 필 리빈 에버노트 CEO는 “실리콘밸리에 처음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한 기업가들의 자세였다”고 말했다. 그 역시 해외 출장 중이 아니면 학생 대상 강연 요청엔 모두 응하고 있다.
교육과 기업문화가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상부구조라면 기술과 투자는 하부구조다. 배 대표와 함께 K그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종영 대표는 “한국 벤처기업엔 정부 지원이 절대적이어서 공모전을 목표로 하다 보니 특화된 기술을 개발할 여유가 없다”며 “미국 정부도 벤처 지원을 하지만 기업의 의존도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돈이 기술을 따라다니고 그 돈이 돌고 도는 자생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창업 후 실리콘밸리로 옮겨온 이유도 풍부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곳보다 더 많아서다.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아 성장한 기업은 또 다른 신생회사에 투자한다.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닉 CEO는 다른 3개 회사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내 인수합병(M&A)도 활발하다. 2005년 안드로이드, 2006년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이 200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238건의 M&A에 들인 돈은 총 237억달러(약 25조3000억원)에 이른다. 구글 같은 대기업뿐 아니다. 에런 레비 박스 CEO는 지난해에만 3개 기업을 인수했다.
심상엽 새너제이주립대 교수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뿐 아니라 투자와 M&A에 대한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이뤄진다”며 “이를 통해 자금뿐 아니라 인재와 기술이 교류되고 시장도 커진다”고 실리콘밸리의 강점을 설명했다.
마운틴뷰·멜로파크=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