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희 < 대동풍수지리학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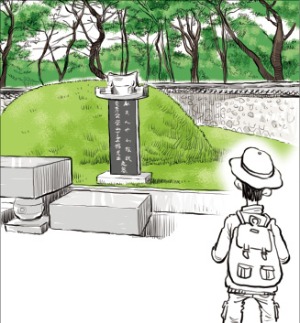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심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던 날, 남양주 능내리에 있는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묘를 찾았다. 어릴 적부터 뛰어놀던 뒷동산을 말년에 유심히 봐 두었다가 ‘집 뒤 자(子, 북쪽)의 언덕에 매장하라(屋後負子之原)’며 선생이 스스로 택한 묘지다. 곡담을 두른 안쪽에 한 기의 묘가 소박한 모습으로 서 있다. 홍씨 부인과 합장한 묘다. 앞에는 고요한 한강이 바다처럼 넓고 강 건너에는 안산이 멀리 아스라이 보인다. 그곳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온다. 하지만 가끔은 누구의 묘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한 바퀴 획 둘러본 뒤 급히 내려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묘는 그 주인이 이 땅에서 실제 살았음을 알려주는 증거다. 덕망 높은 정승이나 당대를 풍미했던 정치가, 천하를 호령했던 장군, 문필에 뛰어났던 문장가와 뭇 사내의 애간장을 태웠던 기생도 모두 이 땅의 물을 마시고 숨을 쉬며 살았던 인물들이다. 시공을 초월하면 우리와 똑같이 삶의 애증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이웃들이다. 전설이나 역사 속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이 땅에서 살다 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기념물 중 묘가 가장 많다. 묘를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는 것은 풍수적 발복을 바라거나 묘지가 명당이라서가 아니다. 그곳에 묻힌 역사 인물의 업적과 정신을 오늘날 다시 배우고 되새기도록, 역사 공부의 현장으로 삼기 위해서다. 묘를 써 사체를 처리하는 매장은 가장 오래된 풍습이다. 또 위생적이라 선호됐다. 우리 조상들은 부모의 영혼과 몸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효심이 깊어 묘지를 함부로 정하지 않았다. 물이 솟거나 바위가 땅속에 깊이 박혔거나 뱀이나 쥐가 사는 땅, 나무뿌리가 광중으로 들어가 유골을 휘감는 장소 등은 흉한 장소라고 생각해 피했다. 이것은 생전에 부모를 편히 모시려고 했던 마음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매장은 효심이 깊이 반영된 장사 방법이다. 절대 반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이기심만은 아니다.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아껴야 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산재한 역사적 인물의 묘,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묘들조차 관심을 두지 않아 안타깝다. 묘를 찾는 일은 자기 성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봄이 되면 묘를 찾는 문화재 답사가 보다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묘는 나 역시 죽음으로부터 예외가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남은 인생을 보다 잘 살도록 각오를 다지게 하기 때문이다.
고제희 < 대동풍수지리학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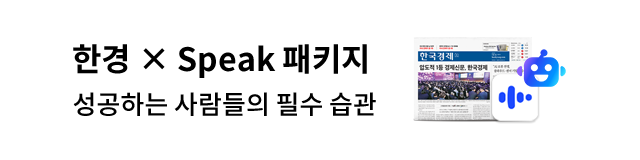


![늘지 않는 1인당 소득…11년째 '3만달러 벽' 갇힌 한국 [임현우의 경제VOCA]](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70941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