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제한'도 부작용 양산…7년5개월 걸려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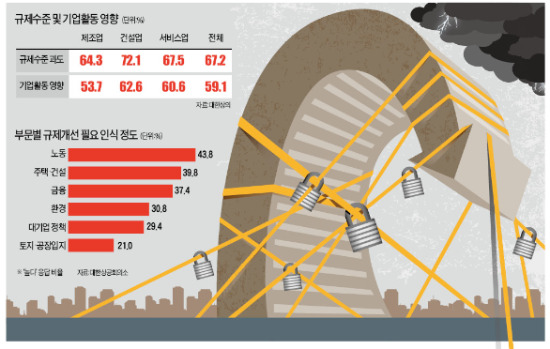
그는 “어렵게 내린 투자 결정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폐수 규정에 가로막혔다”며 “최신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면 수질오염을 낮출 수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절대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50㎥ 상한선은 2003년 1월 도입된 규정이다. 11년 넘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처리 기술이 크게 발전했지만 요지부동인 시행령은 A사장의 사업확장 꿈을 앗아갔다.
◆규제 없애려면 ‘부지하세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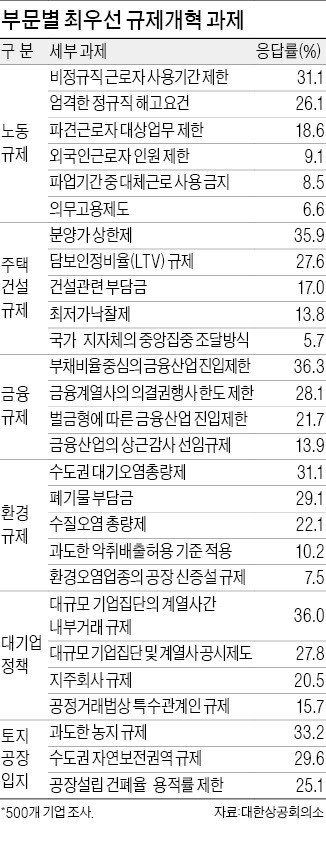
정부는 기업들이 공장을 무분별하게 확장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03년 10월 연접개발제한제도를 도입했다. 공장 면적이 3만㎡(공업지역)를 초과하는 회사가 증설하려면 기존 설비와 50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다.
11일 기자와 만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그해 말부터 회원사들의 불만이 폭주했다”고 회상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와 반대로 난개발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기업은 설비 분산으로 효율성이 떨어진 데다, 공장이 들어설 만한 땅을 투기꾼들이 선점하는 바람에 증설 부담이 커졌다며 비명을 질렀다. 2004년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무역협회(2006년), 전국경제인연합회(2007년)가 잇따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지만 ‘허공에 메아리’일 뿐이었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때마다 연접제한 개선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결국 정부는 시행 7년5개월 만인 2011년 2월 말 국무회의를 열어 제도를 폐지했다. 규제고리를 하나 끊는 데는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상시점검 시스템 도입해야
정부가 규제의 문제점을 알고도 예산부족을 핑계로 개선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많다. 경기 동탄에서 신도시를 조성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장에서 3000㎡ 규모의 고려시대 건물터를 발견했다. LH는 도로와 상업시설 1000㎡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공사 지연은 물론이고 문화재 보존·발굴비용까지 LH가 모두 떠안았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사업 시행사는 발굴조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물론 발굴 문화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GS건설도 서울 종로의 피맛골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조선시대 유물을 발견하는 바람에 발굴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건설사의 민원이 급증하자 2009년 문화재청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발굴비용을 충당하는 발굴공영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5년째 진척이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굴 비용 때문에 건설사들이 신고조차 하지 않고 훼손하는 문화재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석 대한상의 조사본부 차장은 “도입할 땐 타당했던 규제도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생기므로 상시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해영/이현일 기자 bon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