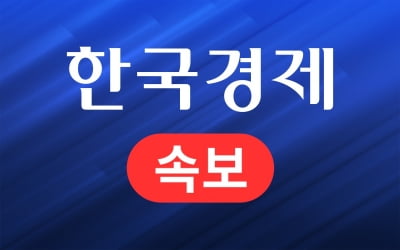기존 판례 깬 대법원 판결 2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뉴발란스 'N' 식별력 생겨…소송시점서 상표권 인정"
"경매 넘어간 압류 부동산, 現점유자 권리 주장 가능"
"경매 넘어간 압류 부동산, 現점유자 권리 주장 가능"
상표권과 유치권에 대해 기존 판례를 뒤집는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유명 운동화 브랜드 ‘뉴발란스’가 U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뉴발란스와 브랜드 표장이 비슷한 운동화를 생산해 온 U사는 2011년 뉴발란스를 상대로 자신들의 표장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두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 등이 서로 달라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U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뉴발란스의 표장이 등록 당시인 1984년에는 식별력이 없었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이뤄진 2011년에는 소비자들이 출처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두 회사의 표장이 서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 등록 이후 식별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중 하나인 유치권에 대해 이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H보험사가 법인 4곳과 일반인 7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유가증권 등을 맡아두는 권리다.
H보험사는 2005년 충주의 한 호텔업자 노모씨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고 그가 지은 호텔에 근저당권(채권을 일정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했다. 노씨가 대출금을 못 갚자 H사는 이듬해 12월 호텔을 경매에 부쳤다. 노씨의 세금 체납도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도 호텔에 권리가 있었다.
노씨와 거래하던 다른 채권자인 법인 4곳과 일반인 7명은 호텔이 경매에 부쳐지기 한 달 전에 모여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갖고 있으니 함부로 경매에 넘길 수 없다”며 H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미 호텔이 압류된 이후에 부동산 유치권을 확보한 피고들은 근저당권자에 대해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H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체납 처분과 민사집행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별도 진행되므로 체납으로 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유명 운동화 브랜드 ‘뉴발란스’가 U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뉴발란스와 브랜드 표장이 비슷한 운동화를 생산해 온 U사는 2011년 뉴발란스를 상대로 자신들의 표장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두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 등이 서로 달라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U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뉴발란스의 표장이 등록 당시인 1984년에는 식별력이 없었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이뤄진 2011년에는 소비자들이 출처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두 회사의 표장이 서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 등록 이후 식별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중 하나인 유치권에 대해 이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H보험사가 법인 4곳과 일반인 7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유가증권 등을 맡아두는 권리다.
H보험사는 2005년 충주의 한 호텔업자 노모씨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고 그가 지은 호텔에 근저당권(채권을 일정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했다. 노씨가 대출금을 못 갚자 H사는 이듬해 12월 호텔을 경매에 부쳤다. 노씨의 세금 체납도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도 호텔에 권리가 있었다.
노씨와 거래하던 다른 채권자인 법인 4곳과 일반인 7명은 호텔이 경매에 부쳐지기 한 달 전에 모여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갖고 있으니 함부로 경매에 넘길 수 없다”며 H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미 호텔이 압류된 이후에 부동산 유치권을 확보한 피고들은 근저당권자에 대해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H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체납 처분과 민사집행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별도 진행되므로 체납으로 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