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페이스북으로 '감정' 전염된다"고?…당연한 거 아닌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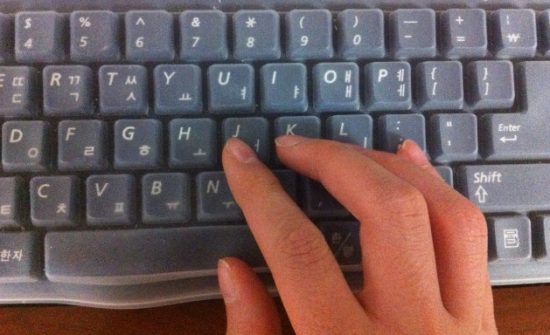
보통 이 같은 정서적 반응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며 극단에 이르는 현상을 영어로 패닉 Panic, 우리말로 공황상태라 표현하지요. 증시에서 이유도 없이 “묻지마”식 매도가 이뤄지며 주가가 순식간에 상상이상으로 폭락할 때 언론은 이 단어를 차용합니다.
“그리스 신 ‘판 Pan’에서 유래한 Panic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의 이유로 ‘공포의 전염성’이 주로 지적됩니다.
이 말의 원전인 신화적 측면에 따르면 얼굴이 뿔 달린 인간이고 몸은 호색적인 염소로 그려지는 판은 극단적 공포심을 유발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가축들이 무엇인가에 놀라 날뛰게 되면 흔히 ‘판의 장난’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문제는 패닉을 일으키는 공포의 전염성이 단지 이같은 ‘신화’속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대과학은 사람이나 동물이 몸속에 공포를 느끼는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공포의 전염성'을 이론으로 뒷받침한다는 얘긴데요.
12년 전 200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신희섭 박사팀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공포를 느끼는데 작용하는 단백질과 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규명해 미국 과학원회보인 PANS에 발표했습니다.
신희섭 박사팀은 이 논문에서 “동물의 신경세포 안에 존재하는 '알파1E’ 유전자와 이 유전자가 만들어 낸 ‘R타입 칼슘채널 단백질’이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전 4경기가 끝난 6월 30일, 연합뉴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발로 보도한 과학기사 ‘“페이스북으로 감정 '전염'된다”…실험윤리 논란’으로 국내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여러 매체가 이 기사를 전재해 보도하고 있고 인터넷 포털에서는 댓글이 다수 달리며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직접 접촉 없이도 네트워크를 통해 ‘전염’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연구 논문 ‘사회관계망을 통한 대규모 감정 전염의 실험적 증거’가 미국 PNAS에 실렸다”는 건데요.
연구 주체자는 페이스북 코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애덤 크레이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제이미 길로리, 코넬대 커뮤니케이션학부와 정보과학부의 제프리 핸콕. 이 실험에 동원된 사람의 숫자는 68만9003명. 2012년에 1주일간 진행.
논문의 저자들은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뜨는 포스트의 노출 확률과 빈도를 조절해 이 게 과연 네트워크 차원의 감정 전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요약본입니다.
“긍정적 포스트’를 접하는 빈도가 감소한 사람들은 긍정적 포스트를 더 적게, 부정적 포스트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부정적 포스트를 접하는 빈도가 감소한 사람들은 긍정적 포스트를 더 많이, 부정적 포스트를 더 적게 생산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에 대해 “다른 페이스북 사용자가 표현한 감정이 나 자신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적 접촉’이나 ‘비언어적 신호’ (non-verbal cues)가 전혀 없이도 감정 전염이 가능하다는 게 연구의 결론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결론이 통념과는 다르다고 주장했고요.
사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읽다보면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이 논문에서 “통념과 다르다며 주장한 결론이 지극히 상식적인 게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공포의 감정마저도 전염성을 지녔다”는 내용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마당에 페이스북에 글로써 적힌 내용이라면 당연히 감정이입이 되지 않을까?“ 의문을 남긴다는 얘깁니다.
뭐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주장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결론을 거부하진 않지만 깔끔하지 못한 ‘감정’이 남습니다.
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
![룰러와 맞대결…T1, 스매시·구마유시 중 누가 나올까 [이주현의 로그인 e스포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68705.3.jpg)
![발등에 불 떨어진 트럼프, 젠슨 황 만난다…"中규제 논의" [강경주의 IT카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370220.3.jpg)
![[속보] 트럼프, 백악관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만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7008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