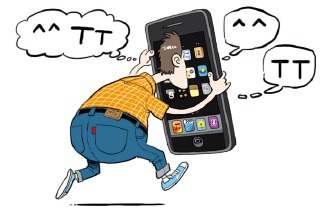
하지만 감정 전염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이전까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과학적인 현상이라기보다 비과학적 오컬트 과정이나 투시와 환상 등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감정 전염을 체계화한 학자는 엘레인 하필드 하와이대 교수다. 그는 감정 전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감정 표현을 반사적으로 흉내내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타인의 감정을 흉내냄으로써 그 사람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도 했다.
감정 전염은 사람마다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딸의 감정은 어머니에게 직접 전염된다고 한다. 반대로 어머니의 감정 상태는 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버지의 감정도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장에선 상사의 부정적 감정 전염은 빠르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전염이 느리다고 한다.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 전염에 더 노출돼 있다. 유럽인이 아시아인들보다 감정 전염이 크다는 것은 다소 의외다. 무엇보다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감정 전염에 민감하다.
문제는 개인의 불만이나 분노가 사회적으로 루머나 괴담의 형태로 전염될 때다. 이런 사회적 전염은 대단히 빠르고 자극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스타 한 명의 비보가 전해지면 평균 600명이 그 영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최근 미국 페이스북 연구진이 사용자 68만9000명을 대상으로 감정 전염을 연구한 결과 부정적 포스트를 덜 접하는 사람들이 부정적 포스트를 더 적게, 긍정적 포스트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 반대도 의미있게 나타났다. 소위 소셜네트워크의 위력이다. 사람들과 대면접촉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페이스북은 감정 전염의 주범이다. 초·중·고등학생 18만명이 스마트폰에, 10만명이 인터넷에 중독돼 있다는 여성부의 발표가 있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감정 전염병에 노출돼 있는 꼴이다. 그러니 사회가 이토록 쓸려다닌다.
오춘호 논설위원 ohchoon@hankyung.com


![[한경에세이] 작은 어항을 넘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7.3912275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