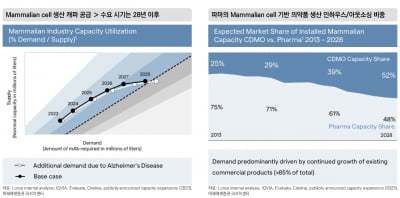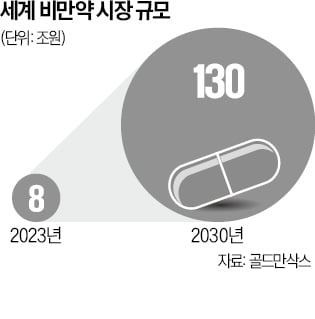재해사망 30% 산사태…예측지도로 피해 줄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학기술 프런티어
채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융합연구센터장
18년간 전국 6000곳 돌며 흙 성분·경사도 등 조사
실시간 경보 시스템 개발
채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융합연구센터장
18년간 전국 6000곳 돌며 흙 성분·경사도 등 조사
실시간 경보 시스템 개발

채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융합연구센터장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국내 자연재해 사망자의 30%는 산사태로 인한 것”이라며 “산사태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라고 말했다.
그는 1996년부터 산사태를 전문 연구하고 있다. 그해 여름, 경기 북부와 강원 철원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사태를 보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18년간 채 센터장은 동료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 2009년 ‘산사태 예측지도’를 만들었다. 지금은 산 경사지에 센서를 심어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아채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매달려 있다.
○도시 주변 산사태 위험 예측
소방방재청에서 쓰고 있는 산사태 예측지도는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권 지역 주요 도시에 대한 산사태 위험을 담고 있다. 채 센터장은 “산림청에도 ‘산사태 위험지도’란 것이 있지만 주로 사람이 사는 곳과 떨어진 산에 대한 것”이라며 “도시 주변에서도 산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지도를 따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학생 연구원을 포함하면 9명, 지질연구원 연구원만 따지면 6명인 채 센터장 팀은 지도 제작을 위해 전국 6000여곳을 찾아다녔다. 그는 “흙의 성분, 경사도, 강우량, 나무의 양 등을 다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흙이다. 흙의 종류에 따라 비가 내렸을 때 이를 계속 머금고 있느냐, 빨리 내보내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편마암이 풍화돼 만들어진 흙은 입자가 작아 물을 땅 속에 가둬 놓게 된다”며 “경기 북부 지역에서 산사태나 홍수가 잘 일어나는 이유도 편마암 점토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원 강릉이나 설악산 부근은 화강암으로 구성돼 산사태 위험이 낮다. 화강암은 흙이 되더라도 해변가 모래처럼 입자가 크다.
이 밖에 산사태는 계곡 부근의 오목한 지형, 그리고 34~40도 이상의 급경사보다 25~30도의 완만한 경사면에서 잘 일어난다. 급경사면에서는 조금만 비가 와도 금방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큰 산사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1시간 전에 대피명령 내려야
지금도 한 달에 1주일 이상 전국을 돌아다니는 연구팀은 산사태가 나면 현장이 훼손되기 전에 도착해 조사한다. 그러다보니 갖가지 위험에 노출된다. 현장을 조사하다 지반이 무너져 다친 적도 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걸어서 가야 하다보니 장비를 들고 5~10㎞ 산속을 걷기도 한다. 비가 많이 내려 범람한 하천을 건널 때는 휩쓸려 내려갈 뻔한 아찔한 순간도 겪어야 했다.
그는 “사람의 출입이 없는 강원 깊은 산골을 들락날락하다 신고가 들어와 경찰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산사태 발생 현장에서 조사하다 보면 복구 기관과 마찰을 겪는 일도 흔하다.
채 센터장은 “산사태를 100% 막을 수는 없다”며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보를 울리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72시간 전에 산사태 위험을 가늠하다 1시간 전 최종 결론을 내려 대피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는 “진행 중인 센서를 통한 산사태 예측 시스템이 완성되면 경사면의 강우량, 흙의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다 신속·정확하게 산사태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