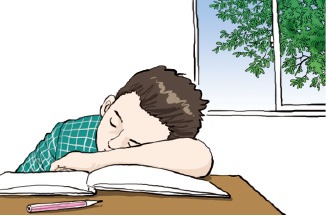
스페인어로 점심시간 후의 ‘달콤한 낮잠’을 뜻하는 시에스타(siesta)는 지중해 연안과 남미 라틴계 국가의 관습이다. 원래는 라틴어 ‘호라 섹스타(hora sexta·여섯 번째 시간)’에서 유래했다. 동틀 녘부터 정오까지의 여섯 시간이 지난 뒤 잠시 쉰다는 의미다. 오후 1~3시에는 도시의 상점과 식당, 사업장, 박물관들이 문을 닫는다.
시에스타의 원인은 높은 기온과 식후 졸림증이다. 스페인어권 국가와 이탈리아, 그리스,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등에 퍼져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일부와 칠레 등은 기후가 캐나다와 비슷하다. 그러니 기후 탓만은 아닌 듯하다. 방글라데시와 벵골만 서쪽 지역에서는 점심 후의 쪽잠을 ‘밥잠’이라고 부른다.
어떤 학자들은 스페인의 신분·계급적 특성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도시인들이 옛 지주나 귀족 등 지배계층의 습관을 흉내내 점심과 시에스타에 3~4시간을 보내며 노닥거렸다는 것이다. 사실 짧은 낮잠은 보약과 같다. 98세까지 장수한 록펠러도 낮잠을 꼭 잤다. 시간은 30분 이내가 적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모두 구제금융을 받은 ‘문제 국가’들이다. 그래서 국가 부도 위기 이후 시에스타 폐지론이 높아지고 있다. 냉방시설이 없던 시절의 관습인 만큼 생산성 등을 감안해 없애자는 것이다. 낮잠으로 인한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8%라니 그럴 만도 하다. 스페인이 관공서 낮잠 금지에 이어 최근 중대형 상점과 식당 영업시간을 25%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영업시간이 두세 시간 늘면 시에스타는 없어진다.
그런데 서울시가 뜬금없이 시에스타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오후 1~6시에 30분 내지 한 시간 자고, 그만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다면 업무 능률이 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하지만 굳이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낮잠을 자려는 직원이 있을까. 별도 예산을 들여 휴식공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발상 역시 생뚱맞다. 더 절박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한경에세이] 별빛 속에 담긴 희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7.39122756.3.jpg)
![[서정환 칼럼] '고려아연 나비효과'가 걱정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7.14286610.3.jpg)
![[천자칼럼] '철밥통 공무원'과의 전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61497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