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권리관계 인수…생각지 못했던 변수 돌출 가능성
고위험 고수익 '틈새시장'
변호사·세무사 등 인맥 만들고 투자자도 전문지식 쌓아야
상가 투자 제1 원칙은 '입지'…어중간한 상권선 임대료 낮춰야

경매 전문가 이서복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법원 경매뿐만 아니라 캠코(자산관리공사)와 신탁사 공매에도 눈을 돌리면 싼값에 상가를 낙찰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힘든 아파트나 우량한 상가 물건 대신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이다. 이 교수는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위험은 커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스스로도 전문가가 될 각오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리관계 해결해야 하는 신탁사 공매
이 교수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사 공매를 들었다.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국내 11개 부동산 신탁사들은 부도현장 물건 등의 공매를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권리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법원 경매와 달리 신탁사 공매는 낙찰자가 대부분 권리관계를 인수한다.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튀어나올 확률이 낮지 않다. 반면 낙찰가격이 경매에 비해 20~30%가량 낮다. 투자 수익률이 일반상가를 분양받거나 경매로 낙찰받는 것에 비해 크게 높다.
최근 이 교수는 신탁사 공매 컨설팅으로 총 감정가 15억원(각 5억원)의 지식산업센터 상가 3실을 3억4000만원(각 1억1333만원)에 낙찰받는 투자를 이끌어냈다. 상가 3실의 임대 조건이 각각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200만~25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연간 수익률은 두 자릿수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의 각 호실에는 취득세 4억8000만원 미납에 대한 안양시청의 압류등기와 약 3000만원의 관리비 미납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가 걸려 있었다. 겉보기에는 상가를 100원에 낙찰받아도 취득세와 관리비를 대신 내려면 오히려 감정가 이상의 비용이 드는 구조다.
그러나 이 교수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안양시의 압류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조언했다. 결국 소송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체납된 관리비만 낸 뒤 상가를 얻은 셈이다.
○전문지식 쌓고 네트워크 활용해야
이 교수는 고수익을 올리려면 마주쳐야 하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전문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1990년대 중반 까다로운 인허가로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기존 공장을 사들이기 위해 경매에 입문했다. 공장을 사려고 시작한 공부였지만 부동산에 매력을 느꼈다. 이후 부동산학 석·박사까지 마치고 전문가의 길로 들어섰다. 20년 이상 부동산을 공부한 그도 초기에는 수차례 입찰 보증금을 날렸다.
이 교수는 전문가 인맥을 만드는 것도 투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맥을 통해 경매의 함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규모가 큰 물건은 힘을 합쳐 투자할 수도 있어서다. 이 교수는 “부동산대학원은 건설회사 임직원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세무사와 금융사 임직원 등 다양한 사람이 있어 인맥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경매 기술보다 투자의 기본이 중요
공매에서 권리관계 분석은 필수다. 이 교수는 물건을 선별할 때 투자의 기본을 꼭 지킨다. 그는 “상가를 찾을 때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평범한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무리 낮은 가격에 상가를 낙찰받아도 애초에 물건을 잘못 고르면 낭패를 본다는 뜻이다.
임차인이 없으면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내는 상황에 몰린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적고 상권이 쇠퇴하는 곳,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공터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를 방치하면 너도나도 쓰레기를 버려 엉망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 효과’가 부동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에 공실이 많은 상가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 교수는 상권이 어중간한 곳에서는 싸게 낙찰받은 만큼 임대료를 낮게 받아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임대료를 높여 공실이 길어지거나 상권이 침체되는 것보다 임대료를 낮추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AI 덧씌우는 K유니콘 [인포그래픽]](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6673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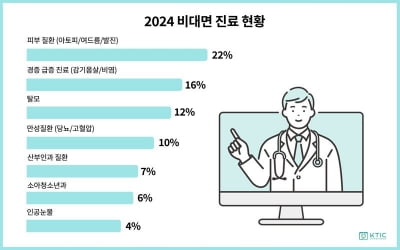

![[단독] "한국이 드디어"…한화오션 등 '1조4000억' 잭팟](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905545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