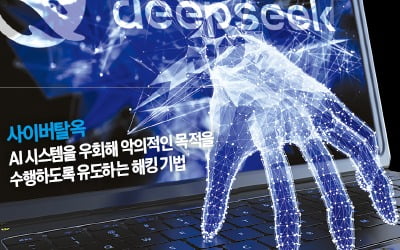여자가 수학 못하는건 유전 요인? "男女 평등한 나라일수록 여학생이 수학 점수 잘 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뉴스속의 과학

여성 최초 수상자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알려지자 남녀 간 수학 성적 차이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자는 남자보다 수학에 취약하다는 통설 때문이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 결과(PISA)에 따르면 한국 여학생의 수학 점수는 남학생보다 18점가량 낮았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일각에서는 뇌 유전자 등 생물학적 차이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2005년 미국 타임지는 남성의 뇌 표면적이 여성보다 10% 정도 넓고 이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뇌의 작용이 다르다고 보도했다. 여성은 좌뇌와 우뇌가 남성보다 잘 연결돼 있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반면 남성은 좌우가 더 확실히 구분된다는 주장이다. 학계에서는 수학을 할 때는 좌뇌와 우뇌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뇌의 차이만으로는 남녀의 수학 점수 차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08년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남녀의 수학 성적 차이가 성불평등지수와 비례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파올라 사피엔자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 교수팀은 PISA 결과를 세계경제포럼(WEF)이 개발한 성격차지수(GGI)를 이용해 재분석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 점수가 평균 10점 정도 높았지만 남녀가 평등한 나라일수록 점수 차가 작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녀 평등 정도가 높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선 여학생의 수학 성적이 남학생과 비슷한 반면 그렇지 않은 터키는 23점이나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진은 올해 4월 업무상 수학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고용자와 구직자들의 편견을 측정한 후속 논문도 발표했다. 구직자에 대해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진 하나만 제시했을 때, 남성이 고용될 확률은 여성보다 두 배나 높았다. 구직자들의 수학 점수를 보여준 후 채용 결정을 내렸을 때도 고용자들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남성은 같은 성적의 여성보다 여전히 30%나 많이 고용됐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