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외환위기를 못 벗어난 外投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동휘 증권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
![[취재수첩] 외환위기를 못 벗어난 外投法](https://img.hankyung.com/photo/201408/AA.9020913.1.jpg)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KKR이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대타를 내세웠다는 기사(본지 8월21일자 A4면)가 게재된 뒤 한 독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런 편법을 방치하면 방위산업체까자 외국인 수중에 넘어가는 만큼 이젠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외국인 투자 규정이 담겨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달러 유치’와 ‘외국환의 원활한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 신문·방송,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등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엔 제한이 없다.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것도 국세청 세무 조사를 제외하곤 불가능하다. 상장사 투자에 적용되는 ‘5% 공시 룰(지분 5% 이상 취득 시 공시하도록 한 제도)’에도 표면상 투자자만 드러날 뿐이다.
미국만해도 외국인이 경영권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에 투자자 자금 출처를 포함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2012년엔 중국 사니그룹이 소유한 롤스코퍼레이션이 소규모 농장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미국 정부는 해군 무기 시스템 훈련지와 가깝다는 이유로 투자를 불허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돈이 어떤 자금인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만해도 외국인 자금의 ‘흑백’을 가리고 투자가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때가 된 것 같다.
박동휘 증권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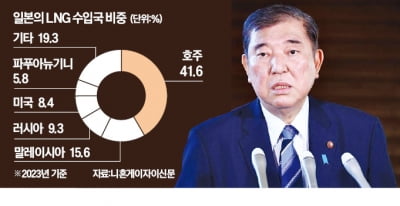
![[단독] 매그나칩반도체 4년 만에 매각 시동…LX·두산·DB 인수 후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3813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