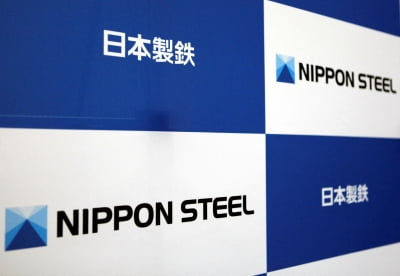[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秀才 최양희라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秀才 최양희라면…](https://img.hankyung.com/photo/201408/02.6938183.1.jpg)
창조경제 ‘수정’ 가능할까
미래부는 지금 ‘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동안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제는 ‘창조’도 없고 ‘과학’도 없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 명칭과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식물 부처’라는 말밖에 안된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출신이 제1차관으로 오자 ‘기재부 2중대’냐는 비아냥까지 등장했다. 창조경제 예산 때문이라지만 그거야말로 관치시대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라던 미래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아마 최 장관도 위기의식을 느낀 모양이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지금이라도 부처 명칭에 걸맞은 일을 하면 된다. 먼저 ‘미래’를 되찾겠다면 정책의 ‘시계(time horizon)’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명색이 미래부라면서 당장의 성과, 당장의 일자리를 다그친 건 큰 패착이었다. 그건 미래부가 또 하나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를 자처한 거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지만 미래부는 3년이라는 틀 속에 갇히는 순간 ‘미래’를 잃게 된다.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정권 내 단기 승부만 반복하다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만 것 아닌가. 차라리 그 다음 정권, 그 다음다음 정권에서 성공해도 좋으니 기꺼이 씨를 뿌리겠다는 철학을 가져라.
‘창조’의 회복도 기존의 창조가 왜 조소거리로 전락했는지 되돌아보면 길이 보인다.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는 시비 같은 건 사실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보다는 창조경제를 외치는 정부가 정작 일하는 방식은 과거 ‘관주도 모방경제’ 그대로였다는 게 잘못이다. 이게 창조경제 추동력을 떨어뜨린 근본 원인이다. 창조경제를 하겠다면 그 프로세스부터 바꿔야 하는 이유다. 일의 순서도 정부부문 개혁부터 하는 게 맞다. 모방체제 부처, 모방체제 정부출연연구소를 갖고 창조경제를 떠들면 그건 코미디가 되고 만다. 임자가 다 정해져 있다는 17조원 연구개발 예산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건 어떤가. 정부가 먼저 패러다임을 바꿔라.
‘미래부=정통부’ 등식 깨야
마지막으로 ‘과학’도 다시 찾아야 한다. ‘미래부=정보통신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정보통신이 달라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규제만 더해졌다는 기막힌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을 뿐이다. 정보통신에서는 규제개혁만 잘해도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 정보통신 전문가인 최 장관이 더 잘 알 것 아닌가. 대신 과학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정권에서 과학이 실종됐다면 그런 아이러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노벨상을 타겠다는 기초과학 연구소는 표류 중이고, 문·이과 통합이란 명분 속에 과학교육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코딩이 아니라 과학부터 제대로 챙겨라.
최 장관이 미래부를 혁신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정권만 바뀌면 부처가 해체되는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