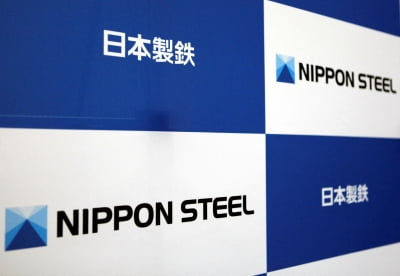독일의 '값비싼 도박'…1조유로 투입, 신재생에너지 비중 2025년 45%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용부담 느낀 기업들 해외로 투자 눈돌려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대해 기업과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유럽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독일이 신재생에너지를 놓고 값비싼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22년 원전 제로’를 선언하고, 원자력과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45%로 높이고, 2050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40년까지 1조유로(약 1340조원)가 투입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이며, 독일 통일 비용과 맞먹는다.
이런 정책은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영향으로 독일 전기요금은 최근 5년간 60% 상승했다.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약 75%가 에너지 비용 증가를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느껴 해외로 눈을 돌린 기업도 증가했다. 화학업체 바스프는 앞으로 5년간 글로벌 총투자의 3분의 1 수준인 독일 투자를 4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아시아와 미국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SGL카본도 미국 워싱턴주 플랜트에 2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워싱턴주 전기요금은 독일의 3분의 1 이하”라고 말했다. 올 2분기 GDP가 0.6% 감소하는 등 독일 경제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WSJ는 “독일 기업과 경제 전문가, 이웃 국가들도 현재 산업시스템을 바꾸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독일 산업은 물론 유럽 경제까지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독일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22년 원전 제로’를 선언하고, 원자력과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45%로 높이고, 2050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40년까지 1조유로(약 1340조원)가 투입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이며, 독일 통일 비용과 맞먹는다.
이런 정책은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영향으로 독일 전기요금은 최근 5년간 60% 상승했다.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약 75%가 에너지 비용 증가를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느껴 해외로 눈을 돌린 기업도 증가했다. 화학업체 바스프는 앞으로 5년간 글로벌 총투자의 3분의 1 수준인 독일 투자를 4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아시아와 미국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SGL카본도 미국 워싱턴주 플랜트에 2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워싱턴주 전기요금은 독일의 3분의 1 이하”라고 말했다. 올 2분기 GDP가 0.6% 감소하는 등 독일 경제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WSJ는 “독일 기업과 경제 전문가, 이웃 국가들도 현재 산업시스템을 바꾸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독일 산업은 물론 유럽 경제까지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