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안의 GPS' 장소세포 발견
30여년 전 연구 이제 꽃 피워
고령화시대, 뇌 연구 집중해야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인 존 오키프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사진)는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기초과학연구원(IBS)·영국왕립학회 리서치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몸 안의 위성항법시스템(GPS)’이라 불리는 ‘장소 세포(place cell)’를 발견한 공로로 올해 노벨상을 받았다. 장소 세포는 뇌가 어떻게 주변 공간의 지도를 만들고, 복잡한 환경에서 길을 찾도록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는 “당시 과학계의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새로운 결과였기 때문에 학계에서 거부 반응이 있었다”며 “네이처나 사이언스지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브레인 리서치’라는 학술지에 제출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편집자와 얘기를 나눈 끝에 겨우 게재를 허락받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일흔다섯의 나이에 ‘뇌 과학의 대가’로 꼽히지만 그가 쥐 실험을 통해 장소 세포의 존재를 처음 규명했을 때 는 32세의 신진 과학자에 불과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오키프 교수는 “장소 세포의 발견은 18세기 독일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고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백지 상태이고, 경험을 통해 내용을 쌓아간다고 봤다.
하지만 칸트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을 알 수 없고,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 마음이 재창조한다고 주장했다. 오키프 교수는 “마찬가지로 물리적 공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장소 세포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앞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지 공간이란 개념을 창조해낸다”고 말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세상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런 장소 세포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설명이다.
뇌 연구에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뇌 관련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는데 세계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장소 세포에 대한 연구 역시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는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장소 세포가 있는 뇌의 해마 쪽이 손상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치매 환자들은 길을 잘 찾지 못하고 헤매는 증상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를 응용하면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증상을 진단해 선제적인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는 “노벨상을 받아 가장 좋은 점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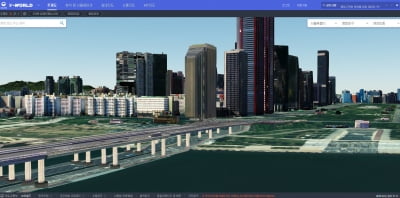
!["스타벅스서 아무 음료 시켜도 단 4000원"…몰랐던 '꿀팁'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4436.3.jpg)
![황정음·이준호, 부동산 투자 '잭팟'…두둑이 챙긴 비결 있었다 [고정삼의 절세GPT]](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8828.3.jpg)




